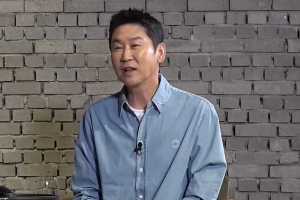10년 집념의 산물 ‘미술 철학사’ 3권 완간 이광래 교수
“미술을 철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욕망과 권력 간 캔버스를 둘러싼 쟁탈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부터 르네상스,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초상화 얼굴들이 달라지고 그 얼굴만으로도 미술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광래 교수



이광래 교수 제공

2007년 2월 집필을 시작해 10년째인 이달 발간된 ‘미술 철학사’를 펴낸 이광래 강원대 철학과 교수의 탁상 달력. 이 교수는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원고 페이지 수를 탁상 달력에 기록하며 총 8400여장 분량의 원고지를 썼다.
이광래 교수 제공
이광래 교수 제공
철학자인 이 교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이트, 라캉, 푸코, 데리다, 들뢰즈 등 철학자의 눈을 통해 미술사를 가로지르는 융합을 시도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정의 내린 미술 철학사를 ‘고고학적’ 철학사와 ‘계보학적’ 철학사로 구분한다. 사회적 구조와 질서가 미술가들의 욕망을 억압해 미술가의 표현이 기계적이었던 고대부터 중세를 바로 고고학적 시기로 명명하고, 철학의 부활이 이뤄진 르네상스 시기 이후를 계보학적 시기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미술 철학사’가 선사 시대나 고대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중세에는 미술가들이 교회 권력이 요구하는 성화를 지시한 대로 그려 내는 게 밥 먹고 하는 유일한 작품 활동이었다면 르네상스 이후에는 미술가들의 자율성이 생기면서 초상화도 중세 성화에서 왕이나 귀족으로 바뀌고, 근대적 권력이 부상한 이후에는 부르주아의 얼굴과 서민들의 얼굴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면서 “미술사를 권력 의지와 욕망이 어떻게 투영되는지로 선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푸코적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술 철학사는 국내선 처음 시도 낯설어
이 같은 미술 철학사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첫 시도다. 미술사는 수없이 많지만 철학자와 미술사를 씨줄과 날줄로 꿰어 엮은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도였다. 그러다 보니 관련 미술 작품들을 책에 싣는 도록 작업도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웠다. 출판사는 도록 저작권료로만 3000만원의 거금을 투입했다.
이 교수는 “거액을 들인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책도 아닌데 출판사가 손해를 무릅쓰고 책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았다. 미술 철학사라는 주제 자체가 낯설다 보니 생존 화가들의 경우 이 교수의 책 내용을 영문으로 먼저 보고 결정하기를 원했다. 영국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부터 프랜시스 베이컨, 안젤름 키퍼 등 20여명의 화가가 이 교수의 책 내용을 영문으로 받아 보는 사전 검토 작업 후 도록 수록을 허락했다. 그렇게 책 3권에 수록된 그림만 859개이고, 조명된 미술 작가는 200여명, 각주는 1400여개가 실렸다.
이 교수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마크 로스코의 회화는 왜 명상이 되는지, 바스키아의 낙서화는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며 “‘나는 분명히 미술의 역사가 철학적 문제로 점철돼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미학자 아서 단토의 말을 미술 철학사로 실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2-0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