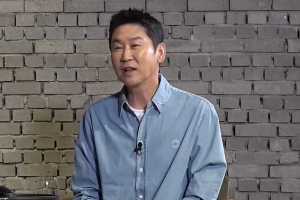정서린 문화부 기자
‘이런 문학’에 요즘 난데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곳들이 있다. ‘내가 품겠노라’ ‘남한테 뺏길까’ 안달복달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애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나라가 우리 문학 자료들을 수집, 보존, 복원, 관리, 전시, 활용하는 종합 문학관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배정된 예산만 480억원이다. 구애가 뜨거울 수밖에.
유치전은 4·13 총선에서 지역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한껏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만 10여곳이 넘는다. 일부는 유치위원회도 출범시켰고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까지 받고 나섰다. 대통령에게 직접 읍소한 곳도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은 문단의 숙원이었다. ‘문학의 해’였던 1996년 언론·교육·문학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근대문학관(당시 명칭) 건립추진위원회까지 꾸렸다. 하지만 이듬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밀어닥치면서 무산됐다.
기대만큼 우려도 번진다. 최근 지자체들의 문학관 유치를 둘러싼 논의를 보고 있자면 ‘당위성 만들기’에 집중돼 있다.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사는 문인들이 얼마나 많고 유명한지’, ‘우리 고장에서 집필되거나 배경이 된 작품이 얼마나 많고 유명한지’이다. 각자의 자랑(?)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학의 산실, 요람이 많았나’ 싶을 정도다. 지역적 정체성, 지리적 접근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국토 균형 발전론 등 유치가 절실한 만큼 이유는 많다.
지역 간 혈투는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 요건을 전제로 한 공모를 내면서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장소 다툼 이전에 정부와 전문가, 우리가 더 곱씹고 따져 봐야 할 게 있다.
문학이 외면받는 시대에 들어서는 문학관이란 어떤 의미를 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다.
‘박제가 돼 버린’ 문화시설은 이미 차고 넘친다. 예산 따먹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지었다가 애물단지가 된 미술관, 박물관들이 각지에 즐비하다. 문학관만 해도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곳만 72곳, 실제로는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콘텐츠, 기획력, 상상력의 부족으로 발길이 이어지는 곳은 극히 소수다.
건물과 간판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우리 문학의 산물이 모두 집결할 국립한국문학관의 우선 과제는 자료의 수집, 보관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연구, 문인들의 창작과 교류 지원, 일반 대중의 향유 등 다양한 ‘활용법’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결국 ‘짜임새’와 ‘쓰임새’가 문학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rin@seoul.co.kr
2016-05-0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