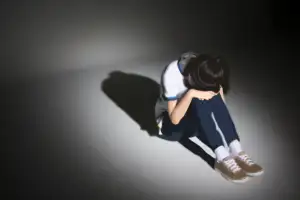최고위서 安 대표직 사퇴 의사에 격론…고집 꺾지 않아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천정배 공동대표와의 대표직 동반사퇴를 밝히 있다. 2016.6.2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13 총선 홍보비 파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국민의당을 창당한지 5개월 가까이 만이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옛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서 비롯됐고, 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4·13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으로 확고한 제3당 지위를 구축했던 만큼 안 대표가 물러난 국민의당은 재정비까지 대혼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 지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시사한데 이어 이날 최고위를 거쳐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기까지 진통이 잇따랐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십 진공상태가 불가피한 만큼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이날 최고위에서도 대다수 참석자들은 안 대표의 사퇴 의사를 극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에서 안 대표가 스스로 들고나온 ‘대표 책임론과 사퇴론’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안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은 당 수습을 위해선 안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며 사퇴시 당이 와해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습이 목적이지 현실 도피해선 안 된다”며 “지금 안 대표가 책임져서 당이 수습이 되겠느냐”며 안 대표 책임론에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번 사태와 대표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다. 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와 각종 토론회 등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논의에 몰두했다.
상임위 참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의원들도 본인 질의 순서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오전 10시쯤 잠깐 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가계속 흘렀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의사봉을 잡고 개의를 선언했지만, 침통한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제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을 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길어지자 잠시 바깥으로 나와 브리핑을 통해 “당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포함해 책임 문제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계속 논의하며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자기 입장을 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격론과 진통끝에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고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대표도 함께 했다.
안 대표 사퇴 이후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대표 권한 대행체제로 갈 것인지는 최고위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만큼 당의 구심점인 안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새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고,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이번 사태에서 안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는 일부 호남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당이 총선 후 지역위원장 선임 등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직 정비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등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