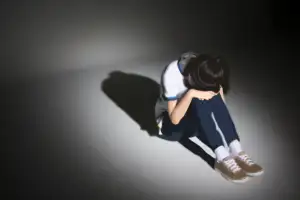안경환·이상돈 공동비대위원장 ‘카드’에도 반발 격화민평련·혁신모임 등 박영선 원내대표직 사퇴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일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깜짝카드’를 또 꺼내들면서 당은 이틀째 롤러코스터를 탔다.전날 내놓은 ‘이상돈 카드’가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이라는 그의 이력 탓에 거센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이번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세워 다시 반전을 시도한 모양새다.
안 교수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보수 성향의 이 교수와 달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내 진보 성향 학자로 분류된다.
특히 안 교수는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야당과의 인연이 깊다.
따라서 안 교수와 이 교수의 ‘투톱’ 비대위원장 체제로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민에게 당 쇄신 의지를 알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를 염두에 두고 영입을 추진했다는 게 박 위원장 측의 설명이지만, 워낙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한 탓에 일각에서는 이 교수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안 교수를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반발 기류는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 교수 경력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데다 박 위원장이 인선 과정에서 내부 소통을 생략했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소속 의원 상당수는 이날 그룹별 모임을 갖고 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물론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으라고 압박, 차기 당권을 겨냥한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민평련 회장인 최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 모두 내려놔야 한다고 전원이 뜻을 모았다”면서 “새누리당 권력을 세우는 데 앞장선 사람이 당 대표를 한다는 건 간판을 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당내 혁신모임 역시 이날 회의에서 같은 결론을 냈다.
오영식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비대위원장 관련 행보를 종합해보면 박영선 체제가 더이상 가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런 뜻을 분명히 박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이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당내 반응이 좋지 않다”면서 “안경환·이상돈 교수가 좋은 조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속 의원 대다수와 상임고문들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상임고문 등 당의 원로들도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상돈 교수를 당대표로 영입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새누리당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정당’이라고 전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자꾸 여의도에서만 묘수 궁리를 하니까 이런 자폭형 참사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돈 교수의 단독 비대위원장이든 안경화 교수와의 공동 비대위원장이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이상돈 영입카드가 계속된다면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다만 중도파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등 ‘합리적 보수’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안 교수와 이 교수의 투톱 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