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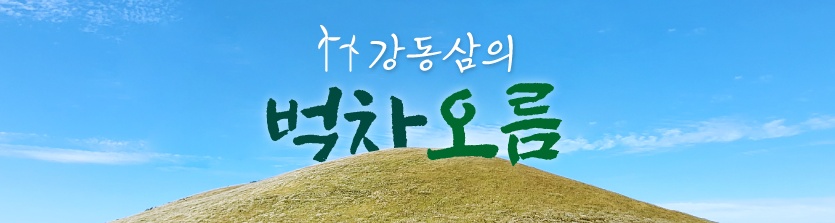
(2)‘오름의 여왕’ 다랑쉬오름
그러나 이미 핸들은 애조로를 타고 봉개동을 지나 표선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제주라는 섬은 작아 보여도 날씨 만큼은 시시각각으로 달라 변화무쌍하다. 간혹 총각 가슴을 쥐락펴락하는 변덕 심한 비바리 같을 때가 더러 있다. 해안가는 멀쩡하게 맑은데 한라산 중산간마을은 때 아닌 눈이 올 때도 있으며 동쪽 성산포는 비를 뿌려도 서쪽 모슬포로 가면 햇빛이 쨍하고 비치기 일쑤다. 평화로를 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다 보면 유수암 쪽에서 내린 눈은 새별오름에선 비로 변하고, 동광육거리를 지날 쯤엔 안개에 휩싸이고 중문을 거치면 비로소 바람 한 점 없이 맑아지는, 그야말로 사계절과 조우하는 일이 많다. 그만큼 제주로 여행오는 관광객들은 지역별 날씨예보를 확인하고 행선지를 선택해야 후회없다.
# 빗줄기 거세지면 정상 탐방 포기하고 풍림다방·스누피가든 플랜B 전략 짜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오름의 여왕 다랑쉬오름에서 바라본 아끈다랑쉬오름과 멀리 성산일출봉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아끈(버금간다는 제주어)다랑쉬 오름을 마주해 외롭지 않을 듯한 다랑쉬오름은 시작부터 가파른 계단이다. 호락호락 보면 안되는 오름이란 생각에 마음을 굳게 잡는다. 한숨부터 나오지만 계단 양옆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어오른 삼나무숲에 반해 꾸역꾸역 오르기 시작한다. 계단이 끝나고 야자매트를 깐 길에 들어서면 아끈다랑쉬오름 인근에 펼쳐지는 밭담의 풍경에 잠시 넋을 놓는다. 안개에 휩싸인 제주밭담이 흡사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불리는 까닭을 알 것 같다. 제주밭담은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4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소중한 자원. 예전엔 미처 몰랐던 아름다움을 이제는 눈에, 가슴에 콕콕 박힌다.
힘든 오르막을 계속 걷다가도 문득 뒤돌아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멀리 우도까지 내다보인다. 옆에는 용눈이오름도 보인다. 멀리에서도 용눈이오름은 사람 발길에 치여 지쳐 보인다. 헐벗은 듯, 갑자기 늙어버린 섬소년을 만나는 듯 헛헛하다.
# 수묵화같은 몽롱한 풍경… 성산일출봉·우도까지 한눈에…그리고 밭담


다랑쉬오름 정상에서 만난 망곡의 자리.
30여분 계단과 야자매트를 번갈아가며 밟고 오르다 보니 정상에서 분화구를 만난다.
해발 382m, 비고 약 227m, 분화구 깊이 110여m, 경작지로 활용했던 흔적이 있는 분화구 둘레는 3391m. 이쯤에서 다랑쉬오름이 왜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 실체는 분화구에서 비로소 만난다.
먼저 다랑쉬오름을 만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 “비단 치마에 몸을 감싼 여인처럼 우아한 몸맵시가 가을 하늘에 말쑥하다”고. 그 느낌은 정상 분화구에서 더더욱 실감한다. 분화구를 한바퀴 도는 동안 경이로운 놀라움과 마주한다.
그 중 하나는 맨 꼭대기에서 만나는 망곡(望哭)의 자리다. 조선시대때 이름 난 효자 홍달한(성산 고성출신)이 꼭대기에 올라와 국왕의 승하를 슬퍼해 하던 자리다. 1720년 숙종 임금이 돌아가시자 그는 이곳에 올라와 설단분향, 수평선 너머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애곡했으며 삭망(초하루, 보름)에도 반드시 올라와 분향하며 산상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그는 뒤에 충효의 이름으로 정려되었다. 김종철의 ‘오름나그네’ 발췌했다는 안내문을 물끄러미 본다.
마치 네모난 돌모양에 팥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시루떡같은 ‘망곡의 자리’에서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적요함에 발길도 멈춘다.
# 망곡의 자리 시간이 멈춘 듯… 정상 분화구 배꼽 속엔 하트모양의 돌담… 경이로움의 끝판왕


둥근달을 품은 듯한 다랑쉬오름 분화구 속에 하트모양의 돌담이 뚜럿하게 보이고 있다.
산봉우리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다하여 월랑봉 혹은 높은 봉우리란 뜻으로 도랑쉬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연유를 정상에선 더 느낄 수 있다. 실제 둥근 굼부리에서 보름달이 솟아 오르는 모습은 송당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하여, 마을의 자랑거리라고도 한다. 다랑쉬오름은 패러글라이딩 천국이기도 하다.
친구 Y는 “제주도에 발령 나 처음 간 오름이 다랑쉬오름이었다”며 “그곳에서 우연히 경험한 패러글라이딩, 그 하늘에서 바라보는 다랑쉬오름과 그 일대의 풍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질을 했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그런데 지면 어떠랴. 친군데.
# 스코리아 지형과 회갈색 소사나무 군락지 신비로움 더해


회갈색 모양의 소사나무 군락지.
분화구 한바퀴를 거의 다 돌 때쯤 만나는 회갈색 소사나무 군락지도 독특한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새싹이 돋지 않은 채 늙은 모습인 나무가 야위어 안타깝기 보다 아직 때묻지 않은 소녀같은 키 작은 모습으로 밀집해 있어 신비롭다. 약 1시간 30분의 만남. 여왕은 여왕답게 기품있고 한편으론 경이로웠다.
# 잠깐, 여기 들렀다 갈래#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4·3의 아픔 대물림되는 곳 다랑쉬굴


구좌읍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집단 희생된 곳 다랑쉬굴 입구. 지금은 돌로 막혀 입구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랑쉬오름에서 내려와 마지막 전봇대에서 좌측으로 꺾어 대나무숲길을 구비구비 돌아가면 지난 1992년, 유해 11구가 발굴된 다랑쉬굴과 만난다. 이런 비문과 만난다. 그러나 너에게 가는 길은 초라하다. 75년이 흘렀는데도 너를 외면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도로 곳곳이 진흙탕이고 도로가 물에 잠겨 아슬아슬하게 진입해야 하는데 널 이렇게 예우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더라.


다랑쉬굴 근처에는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이 세운 표지석과 돌탑이 쌓여 있다.
1948년 12월 18일 그날, 하도리, 종달리 사람 11명에 포함된 너도 피신해 영문도 모르게 숨었지. 군경민 합동 토벌대가 수류탄 등을 굴 속에 던지며 나올 것을 종용했지만 너는 동요조차 하지 않았어. 어차피 죽을 걸 안 것처럼…. 토벌대들이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너희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숨을 끊었어.
훗날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제주4·3연구소 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집단 희생된 이 곳을 발견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어. 그러나 현장 검증후 제주도지방경찰청은 죽음의 원인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발표했지. 아픔도 대물림되더라. 75년동안 대물림되더라.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 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변해 바다에 뿌려졌어. 너처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도 포함돼 있었어. 그런데도 제대로 정밀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발굴 45일 만에 화장돼 바다에 뿌려졌어. 사람들이 미안해하며 다랑쉬굴 4·3희생자 유해를 도민장으로 하고 합동묘역을 조성해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지. 한줌의 재로 김녕리 앞바다에 뿌려지고 말았어. 미안해. 그리고 유물들만 그대로 남긴 채 1992년 4월 7일 입구를 다시 봉쇄했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아니 숨겨질 것처럼….


다크투어리즘 푯말에 매달려 있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리본들.
우리는 이유도 없이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어. 진행형이야.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슬픔, 꺼낼 수 없는 아픔, 이젠 나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75년 전처럼 비극은 제자리를 맴맴 돌고 있어. 굴 속에는 뼈 잔해와 너희들이 썼던 놋그릇, 물허벅, 솥같은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도 말이야. 닫혀버렸어.
유족이 된 네 가족들은 음력 11월 18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전날인 음력 11월 17일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단다. 오늘 우리집이 시겟날(제삿날)이면 옆집, 그 옆집도 시겟날인 경우가 많은 섬, 숨죽이며 조용히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있는 섬, 3만여명의 영혼들이 동백꽃잎이 되어 흩날리는 섬….
얼마 전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기획 특집(3월 29일자 14면)을 준비하면서 제주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한 검사와 인터뷰하던 중 실감나게 한 비유가 떠올랐어.
“제주도민의 10%인 3만여명이 4·3사건으로 희생됐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사망한 4만~5만여명(시리아포함 10만명 넘는 사망자 예측)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진은 자연재해인데 4·3은 무고한 탄압에 의한 희생이었습니다”라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