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바쳐 사랑한 詩, 무엇인지 모른 채 떠나고 싶다는 황동규 시인… 18번째 시집을 펼치다
봄비를 맞다/황동규 지음/문학과지성사/156쪽/1만 2000원
고3 때 쓴 연애시 ‘즐거운 편지’‘사랑의 사소함’으로 신기원 열어
마지막을 예고한 이번 시집서도
참새·멧새 등 작은 것 향한 시선
“구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 거두는
‘나이 들어감’과 치열하게 싸워 와
그래야 예술이고, 문학이고, 시죠”

오장환 기자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 인근 삼일공원에서 만난 황동규 시인이 초록을 풍경으로 서 있다. 척추협착증으로 거동이 쉽지 않았지만, 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소설 ‘소나기’ 황순원 작가의 장남이기도 한 그는 얼마 전 출간한 시집 ‘봄비를 맞다’가 “자신의 마지막 시집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황동규(86) 시인의 18번째 시집 ‘봄비를 맞다’를 펼쳤다. 울다가 웃다가, 끝에서는 놀란다. 외로움을 직시하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시인의 태도 때문이다. 공수래공수거, 늙는다는 건 인간이 본디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 하지만 시인은 외로움을 향해 ‘어디 한번 해 보자’고 맞선다.
시집을 후딱 읽어 치우고, 마음에 박힌 시편을 몇 개 접어 시인을 만나러 갔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 근처 삼일공원 벤치에 그와 나란히 앉았다. 1958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해 첫 시집 ‘어떤 개인 날’을 펴낸 게 1961년이다. 어느덧 고희를 바라보는 시력(詩歷)을 시인과 기자가 함께 찬찬히 톺았다. 기자의 질문은 다소 헤맸으나, 시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82세 때부터 썼으니까 늙음을 이야기하게 돼 있죠. 물리적으로 마지막 시집이 될 게 분명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쓸 것이고, 최근에도 몇 개 메모했는데…. 이 시집에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건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초부터 확 꺾였단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다”고 단언했다. 죽음이 없으면 삶이 무슨 의미인가. 죽을 존재만이 삶의 아름다움에 경탄할 수 있음을 시인은 모르지 않았다. “직전 시집을 마지막으로 할까도 했는데, 코로나가 나를 불러일으켰어요. ‘집콕’ 하면서 시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늙는 건 외롭고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들었지만, 외로움에 패배한 시는 없을 거예요. 성공하든 못 하든 일단 마주치고 봤으니까.”
‘즐거운 편지’(1956)는 한국 연애시의 신기원으로 평해도 모자람이 없는 시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고3 때 짝사랑을 생각하며 썼다는 이 시의 당대 파급력은 엄청났다. 스물도 안 된 청년이 어찌 “사랑의 사소함”을 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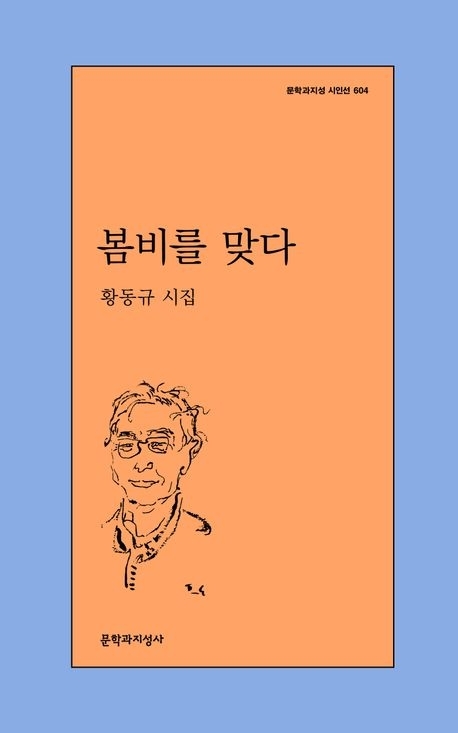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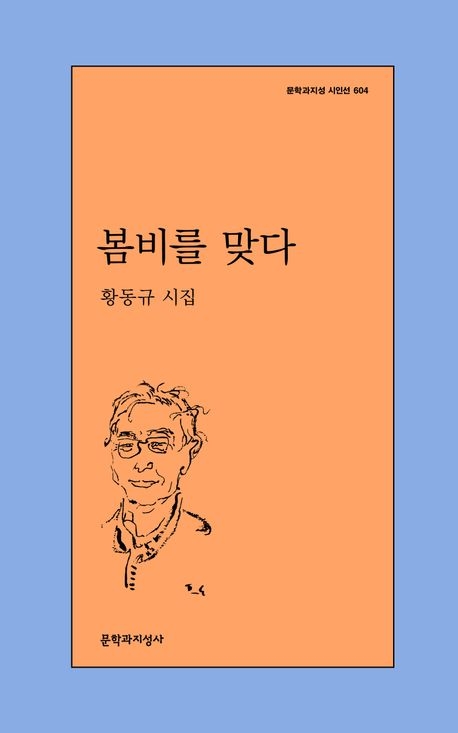
황동규는 문단에서 ‘문지시인’으로 호명된다. 올해 600호를 넘긴 문학과지성사 ‘문지시인선’ 1호 시집이 바로 그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1978)다.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문학평론가 김병익과의 인연으로 이후에도 주로 문지에서 시집을 냈다.
“처음엔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당대 이름 있는 시인들이 다 이걸 노렸거든. 황동규를 1호로 하면서 이전에 나온 시인들은 (여기서) 못 낸다는 거야. 다들 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반대편 ‘창비시인’의 거목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신경림이다. 고인과의 인연을 물었더니 “그 사람 판과 내 판이 따로 있었지만, 만나면 세상일 많이 얘기했지”라고 답했다. “두 사람 다 서로의 시를 좋아했죠. (신경림이) 민요를 해서 (시의) 리듬이 참 좋았지. ‘농무’도 괜찮았고.”
70여년간 시작(詩作)을 밀어붙인 원동력을 그는 “시에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평생 일하면서도 장(長)자리는 되도록 피하고자 애썼다. 혹여 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싫었단 이유다.
“나이가 들면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줄어요. 나는 그것과 싸우면서 왔지. 어떤 비평가가 이상한 칭찬을 하더라고. ‘아직도 사실을 사랑하는 거의 유일한 시인’이라고. 치열하게 싸워야 해요. 그래야 예술이고, 문학이고, 시죠.”
참새, 멧새, 여우, 다람쥐….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작은 것들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소한 사랑’을 노래했던 시인은 아직도 ‘구체적인 것’들을 향한 사랑을 이어 가고 있다.
‘묘비명’이라는 제목의 시가 마음에 걸린다. 진짜 묘비명으로 염두에 둔 거냐고 물었더니 한바탕 웃으며 아니라고 했다. 기자가 ‘살아 있는 게 아직 유혹일 때 갑니다’라는 시구가 나오는 시 ‘뒤풀이 자리에서’를 들이밀었더니 시인은 “이걸로 해야겠다”며 무릎을 쳤다.
시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묻자 대답을 사양했다. “시인은 그걸 모르고 죽어야지”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물 흐르듯 이어지던 인터뷰가 마지막에 탁 멈췄다.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일면을 형상화하려고 일생을 보낸 시인. 시에 미쳐 살았으니까, 지금껏 내내. 그거죠.”
2024-06-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