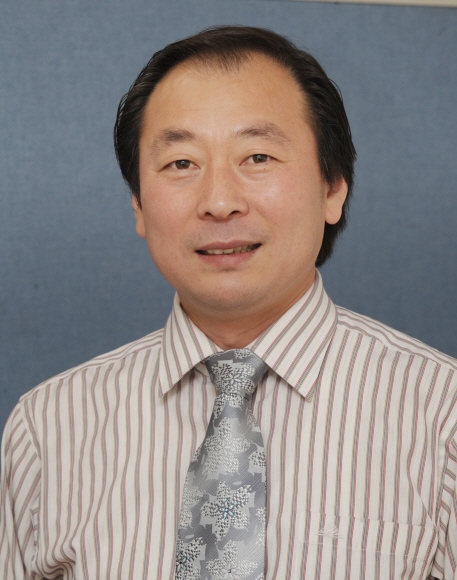
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인류 역사는 문화재 수난사와 겹쳐진다.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이나 전쟁 혹은 분란의 와중에 강제 이전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숱하다.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에 일찍 눈떠 지킴이 노릇을 했던 선각자들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그들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중 파리의 문화재를 멸실 위기에서 건져낸 파리 점령군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 장군을 빼놓을 수 없다. ‘파리 사수가 불가능할 경우 잿더미로 만들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도 파리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군에 일부러 항복해 포로가 된 인물이니 ‘문화재 지킴이의 영웅’으로 추앙됨이 당연해 보인다.
세계가 ‘원래 자리’의 문화재 가치에 눈뜬 건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이 1954년, 문화재 약탈·반환과 관련한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반출·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1970년에야 체결됐다. 그나마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전리품 격으로 획득한 약탈문화재의 최대 보유국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있다. 피해국들이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 간 위원회’(ICPRCP)를 결성, 약탈유물 되찾기 공조를 벌이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의 수준이다.
5년 전 화재로 무너진 숭례문이 각계의 눈물겨운 복원 노력 끝에 4월쯤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숭례문 현신의 반가운 소식과 맞물려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숭례문 참사가 어처구니없는 폭력과 몰인식의 표상이라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제에 빼앗기고 훼손된 혼과 민족 정체성 보상에 대한 뒤늦은 각성의 교훈이다. 숭례문의 제 모습을 최대한 되찾기 위해 기존의 석축 석재며 누각 목재를 많이 썼다지만 복원은 복원이다. 부석사 불상도 일본 관음사와 관련부처에 호소하는 등 원 소장처 서산 부석사로 반환시키려는 노력이 분출하지만 반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화재와 관련해 모양만의 복원과 복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헛수고일 뿐이다. 프랑스로 강탈된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온 건 145년 만의 일이다.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도 90년 만에야 돌아왔다. 그것도 완전한 반환과는 거리가 있는 조건과 명분의 귀환이다. 한 번 옮겨지고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되돌리고 복원된다 해도 원래의 자리에서 뿜어내는 원형과 진짜의 가치에선 멀다. 파리의 문화재를 통째로 구한 파리 점령군 사령관의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원형 문화재의 가치를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외침이 괜한 것일까.
kimus@seoul.co.kr
2013-02-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김정은 “특별한 선물”…아빠 옆에서 저격소총 쏘는 김주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8/SSC_202602280948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