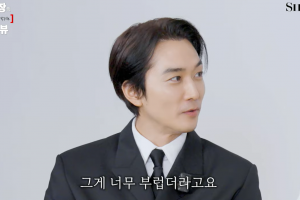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27년이 지났다. 협약 당사국회의가 개최되는 매년 12월이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산업계의 휘황한 공약이 발표된다. 기후변화 기사도 넘쳐난다. 그러나 그때만 넘어가면 사람들의 관심은 흐릿해지고 다시 일 년이 흐르는 일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느릿한 대응 속에 온실가스양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기상기구·유엔환경계획·기후변화 정부간패널(IPCC)이 공동보고서(‘United in Science’)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7.8※에 달했다. 지난 300만~500만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도 지난 30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는 410※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 상승했고 최근 5년이 기상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던 해인 것이 당연해 보인다.
각국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정책으로 국제사회 목표인 2100년까지 1.5도 내 억제는 불가능하다. 2.9~3.4도까지 상승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공동보고서에 담겨 있다. “수천억t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절규해도 현세대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다.
IPCC는 1.5도 억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단,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5배쯤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현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만큼 강하다. 2020년 파리협정 발효에 앞서 각국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제출하고 있다. 소리만 요란한 공약이 아니라 작더라도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대열의 앞줄에서 한국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30년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국가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2019-10-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