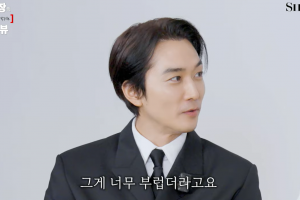엉망진창이고 끔찍한게 전부
‘플래닛 테러’가 싫다면 아마 이야기는 엉망진창이고 장면들이 끔찍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묘하다.‘플래닛 테러’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엉망진창이고 끔찍해서가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플래닛 테러’는 의도적으로 못 만든 척하는 영화다.70년대 미국의 동시상영관 ‘그라인드 하우스’에서 상영되던 싸구려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 일부러 당시의 스타일을 그대로 패러디해 만든 영화인 것이다. 스토리는 엉망진창이고, 야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듬뿍 집어넣고, 일부러 필름이 낡거나 끊겨버린 효과까지 써먹는, 아주 기괴하고 유치찬란한 영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 엉망진창을 사랑한다.

텍사스의 한 마을에서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바이러스가 퍼진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비들의 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든다. 전형적인 좀비 영화의 스토리이지만,‘플래닛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 다리에 기관총을 단 여인이다. 댄서인 체리달링은 좀비에게 도망치다가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하는 부상을 입는다. 보통 여성이라면 끔찍한 불행에 눈물을 흘렸겠지만, 체리달링은 오히려 육체적 불행을 여전사로 거듭나는 행운으로 되돌린다. 다리에 기관총을 장착한 채 댄서인 전력을 활용해 자유자재로 기관총을 발사하는 강력한 여전사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물론이다.‘플래닛 테러’에서 논리와 리얼리티를 찾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플래닛 테러’는 그냥 웃고 즐기자고 만든 영화다. 영화를 고상한 예술로만 생각한다면,‘플래닛 테러’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다. 하지만 영화가 소수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술인 동시에 오락이고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플래닛 테러’는 한없이 즐거운 몽상이고 킬링타임에 딱 적합한 볼거리다. 소수가 보는 예술영화와 마찬가지로, 소수가 보는 싸구려 오락영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화평론가
2008-07-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