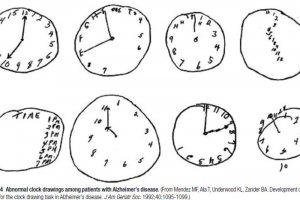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파씨의 입문】황정은 지음 창비 펴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어떤 게 현실이고, 어디까지 공상일까 하는 궁금증이 인다. 초반에는 읽어 내리기에 다소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점점 그의 문체에 적응할 즈음 어느새 마지막 단편에 다다랐다.젊은 소설가 황정은(36)씨의 두 번째 소설집 ‘파씨의 입문’(창비 펴냄)은 확실히 매력이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7개 문학지와 2개 소설집에 실린 단편 9편을 모았는데 은근한 흐름이 읽힌다.
고씨와 한씨, 박씨와 백씨를 형과 동생, 형수님과 제수씨로 얽어 놓은 첫 단편 ‘야행’에서 이들의 가족관계가 어찌 이리되나 고민하다가 환상을 접해버렸다.
“책. 책. 무슨 시계 소리가. 책. 책. 책. 그보다. 사람들은 내가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바쁘다.…저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싸운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 책. 책. 책. 책. 책.”
짤막한 대화가 이어지더니 곰이 시계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빠지자 온통 글투성이가 된다. 당혹스럽다.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잡념 속으로 끌어들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부조리극 한 편을 마무리해버렸다. 환상은 죽어 잊히는 것들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은 원령의 시선으로 한 남자의 삶을 그린 ‘대니 드비토’와 3년째 떨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그린 ‘낙하하다’, 다섯번 죽고 다섯번 살아난 길고양이의 삶을 그린 ‘묘씨생’은 있을 법하지만 관심을 두기에는 난감한 어떤 존재를 다뤘다. 그럴듯하게 사실적인데, 정작 존재의 유무를 대입하자니 어쩐지 오싹하다.
“서쪽에 다섯 개가 있어.”라는 항아리의 목소리를 듣고 길을 나서는 ‘옹기전’이나 일일 바자회에서 양산 파는 아르바이트생의 하루를 담은 ‘양산 펴기’까지 이어지면 단편의 흐름은 존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인가 싶다. “귀신 붙는다.”며 내다 버리라는 부모의 호통에도 “마음먹고 버리면 거기가 버릴 데”라는 노인의 충고에도 항아리의 말을 쫓아가는 아이는(‘옹기전’), “자외선 차단 노점상 됩니다 안 되는 생존 양산 쓰시면 물러나라 기미 생겨요 구청장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라 나와라 가볍고….”라고 엉킨 외침은(‘양산 펴기’)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희미한 존재에 귀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간결하면서 리듬감 있게 흘러가는 문장으로 긴장감을 전달하는 기교, 서사(敍事)가 환상이 되고 환상을 다시 현실로 옮겨 오는 이음새가 마지막까지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 작가의 매력이다. 1만 1000원.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12-0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