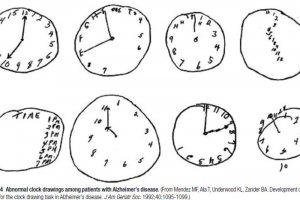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사회뿐만이 아니라 학문에서도 대립은 일상적인 현실이다. 공학은 공학대로, 기초학문은 기초학문대로 자신들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고 항변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힘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 힘의 행사에 스러지는 이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힘은 때로는 돈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의적 법의 모습으로, 때로는 탈맥락화한 지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시장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함께 사는 문제는 다만 현실의 잔인함을 감추기 위한 강한 자의 수사학적 언어나 약자의 절규 속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에 의해 구성된 세계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피해자이면서도 또한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벽을 쌓는 것, 그리고 그 벽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끝없이 힘으로 확장하려는 욕망이 소통 자체를 거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이부동(和而不同:화합하되 같지 않음)이니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음을 구하기 위하여 다름을 내버려 둠)니 하는 소통을 위한 ‘전략적 접근’조차 거부된다. 마주 앉은 정적에게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고 묻고 자신이 정해 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한국 사람이 되지 못한다. 자신이 쌓은 벽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적으로 정복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소통의 부재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앎의 부재’에 의존한다. ‘앎’은 호주머니에 담아두었다가 심심할 때 꺼내 맛보는 사탕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이해를 위한 기본적 전제이며, 출발이며, 소통의 시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앎’조차 마치 호주머니 속의 사탕처럼 필요할 때 꺼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앎으로서의 지식’은 탈맥락화된 채 감성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고, ´평생교육원의 놀이´로 폄하되었다.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힘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셀 세르는 ‘지식은 서로 나누고,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지식은 평화를 낳는다.’고 말한다. 세르가 볼 때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이다. 메시지를 유통시킴으로써 과학과 과학을, 과학과 문학을 중재하는 헤르메스적 존재를 통해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평화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식의 지평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백과사전주의자가 되었다.
소통의 어려움이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대립과 갈등 상황이 무지에서 기인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서로를 알기 위한 진지한 지적 노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쌓았던 벽을 허물고 그 어둠에 빛을 들이는 일(en-light)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자는 “배웠으되 생각이 없으면 헛되고, 생각이 있으되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러한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소통, 바로 그것이 화해를 위한 길이다.
2011-10-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