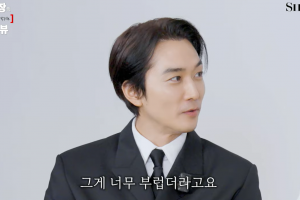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그런데 환자들은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몇 명을 진료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학교에서처럼 다른 환자들과 동시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몸이 아픈데 남들에게 신경 쓸 여유는 당연히 없을 터이다. 그러니 의사가 서둘러 진료를 마치며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그러나 의료진 한 명이 몇 명을 진료하느냐는 교사 한 명이 몇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느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의료진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짧은 진료 시간은 불필요한 약제 처방, 항생제 남용, 의사소통의 장애, 안전사고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낳는다.
대개의 선진국에서 의사 1인당 하루 외래 진료 환자 수는 20~25명, 당직 근무 시 담당하는 입원 환자 수는 의사 1인당 15~20명, 간호사 1인당 5명 내외다. 그러나 내가 주로 경험하는 종합병원의 내과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진료하는 외래 진료 환자는 50~100명이다. 입원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전공의는 주간에는 30~40명, 야간 및 주말 당직 때는 10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간호사 1인당 담당 입원 환자 수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상급종합병원이 16명, 일반병원은 40명에 이른다고 최근 보고됐다. 교실은 콩나물 교실을 벗어났는데 병원은 아직도 콩나물 병원인 셈이다. 여기까지가 평소 상황이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더 심각하다. 여전히 바글대는 외래대기실과 응급실, 병실은 거리두기는 포기하고 마스크만으로 버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환자 유치’에 늘 적극적이다. 환자를 많이 봐야 병원의 경영이 유지되는 의료 수가 구조 탓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민간병원의 탐욕 때문이며, 공공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국립병원에서도 근무했었는데, 그곳에서도 환자를 더 많이 보라는 압박은 사립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진료 실적을 진료과끼리 비교해 의료진 간에 은근한 자존심 싸움을 붙이고, 많은 환자를 진료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일어난다. 만약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학급에 더 많은 학생들을 받도록 독려하고 그만큼 더 성과급을 주겠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어떨까.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최근 의료 파업으로 의사의 수가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은 매우 치열했지만, 합의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처럼 의사 수가 아니라 환자의 수부터 출발하는 것이 인식의 차를 좁혀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소한의 진료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몇 명일까. 적절한 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은 의료진을 얼마나 더 많이 고용해야 할까. 고용에 드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모두 어려운 질문이지만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불만인 우리의 의료제도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 한다.
2020-10-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