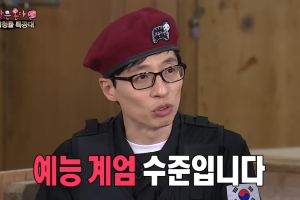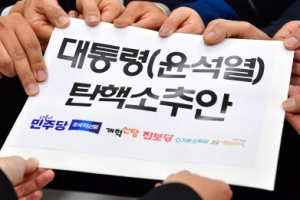장은수 출판문화편집실 대표
현실이 지옥인데 독서 진흥과 관련해 낡은 사고를 하는 이들이 있다.
도서관·박물관 같은 책 관련 공간을 늘리면 독서 인구도 ‘저절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도서관 숫자 가설’이라 하자.
2013년 공공도서관 숫자는 813곳, 방문자 수는 2억 8702만명, 대출 도서 수는 1억 3089만권이었다. 같은 해 성인 독서율은 74.4%였다. 이 숫자의 변동을 좇아 보면 앞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042곳으로 28.2% 늘었다. 작은도서관 역시 4686곳에서 6058곳(29.3%)으로, 대학도서관도 430곳에서 453곳(5.3%)으로, 학교도서관도 1만 1390곳에서 1만 1644곳(2.2%)으로 늘었다.
서울 등 주요 대도시라면 어디에서든 집이나 직장에서 걸어서 도서관에 갈 만한 숫자다. 현 정부 생활형 SOC 사업에도 도서관이 들어 있으니, 조만간 봇물처럼 도서관이 쏟아질 느낌마저 든다.
‘도서관 숫자 가설’에 따르면 책 읽는 사람도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같은 기간 성인 독서율은 11.5% 포인트나 하락했다. 공공도서관 숫자는 늘었지만, 2017년 전체 방문자 수는 2억 7207만명으로 5.2% 줄었고, 대출 도서 수 역시 1억 2663만권으로 3.3% 감소했다.
현실이 이렇다. ‘도서관 숫자 가설’은 틀렸다. 책 관련 공간을 늘리는 일로는 더이상 독서를 진흥하지 못한다.
출판계는 ‘도서관 숫자 가설’을 버리고 독자 부흥의 무거운 임무를 진 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도서관 숫자와 장서량이라는 하드웨어는 독자활동과 참여라는 소프트웨어 기획 없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일단 비독자로 떨어진 후 저 홀로 결단해 독자로 돌아온 사람은 드물다.
연령별 독서율 그래프는 하방경직성을 보인다. 초등학생 독서율은 무려 96.8%에 이르지만, 20대는 73.5%, 40대는 61.9%, 60대 이상은 고작 47.8%에 지나지 않는다.
설문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발적으로 독서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이 부모나 스승 등이 권해서, 아침 독서 시간이 있어서, 친구랑 함께하고 싶어서, 강연이나 수업을 듣고 호기심이 일어서 독자로 돌아온다.
한마디로 비독자를 독자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이 독자를 만든다. 이를 ‘독자활동 가설’이라고 하자.
이런 뜻으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 발표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독서정책의 초점을 ‘홀로 읽기’에서 ‘같이 읽기’로 전환하고, 독서공동체 참여율을 5년 안에 3%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등 독서활동에 초점을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독서공동체는 지역 내 독자활동의 풀뿌리이자 촉매이기 때문이다.
2018년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에 따르면 독서공동체 참여자 연간 독서량은 20~30대 27권, 40~50대 40권, 60대 이상 13권 등 평균 19권이다. 국민의 평균 독서량 8.3권을 훨씬 넘어선다.
특히 세대별 독서율과 달리 20~30대보다 40~50대 독서율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자. 독서절벽에 떨어진 중·노년 연령대에서 독서공동체 참여 같은 독자활동은 읽기를 진흥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독자활동 가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은 과연 독서를 진흥할 수 있을까. 기대를 걸고 싶다.
2019-05-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