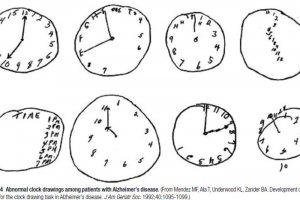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우선 권위의 ‘이해랑 연극상’ 수상자들이 꾸미는 무대라는 점.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이론가 겸 연출가 이해랑은 1951년 ‘햄릿’을 국내 최초로 전막 공연했던 인물이다. 한국 연극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 때문에 사후에도 그를 기리며 따르는 이들이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그들을 중심으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였다.
수상자 출연진 대부분이 50∼60대다 보니 ‘햄릿’ 캐스트는 그 자체가 연령을 파괴하는 파격이었다. 원작대로라면 청년이어야 할 주인공 햄릿과 오필리어 역을 맡은 배우의 실제 나이는 60대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테지만 이런 캐스팅은 도리어 참신한 연출과 해석으로 비쳐 작품의 신선미를 더해 주었다. 또한 가십성 이야기도 화제였다. 전직 장관 두 명(손숙 전 환경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한다는 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대 밖 연극인의 사회적인 기여도와 위상을 보여 주는 사례여서 화제가 되는 것이다.
그 장관 출신 출연 배우 중 단연 주목할 이는 햄릿 역이었다. 평소 ‘햄릿’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며 스스로 ‘영원한 햄릿’으로 남고 싶은 사람 유인촌 전 장관이었다. 한국에서 배우가 장관이었던 적은 그가 처음은 아니다. 영화 ‘서편제’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명곤이 앞서 그 길을 열었다. 그는 오히려 배우보다는 ‘광대’라는 말을 좋아했다. 배우이건 광대이건 다 같이 무대 연기자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는 없다.
연극 ‘햄릿’에서 60대 유인촌 햄릿은 펄펄 날았다. 능청맞고 집요하고, 심지어 전략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서 상식 밖이었다. 흔히 우유부단한 인간형의 대명사로 통하는 그 햄릿이 아니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비장미의 절정이었다. 비탄에 몸부림치는 호레이쇼를 뒤로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햄릿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나의 무대, 나의 연극, 배우는 나야, 자넨 관객이고. 사라지는 건 내 몫이고 남는 것은 자네 몫이지.”
장관을 그만둔 뒤 배우 유인촌을 무대에서 보는 일은 한동안 어려웠다. 현직에 있을 때 논쟁적 인물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때문에 연극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에서도 서먹서먹한 이들이 많았다. 휴식 기간이 필요했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 햄릿의 독백처럼 ‘남는 것은 자네 몫’이 된 지금 유인촌은 명불허전을 입증하며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왜소할 대로 왜소해진 요즘 연극에서 과연 이만한 무게와 부피를 가진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연극 ‘햄릿’은 증명했다.
예술가들의 중심 무대인 문화예술계도 엄연한 사회의 중요한 한 영역이자 축소판이다. 그 판을 벗어나 무슨 역할을 하든 그 또한 개인의 몫이다. 모두가 세상을 무대로 한 배우요, 저마다 등퇴장할 때가 있다고 말한 이는 셰익스피어다. 각자의 무대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하며 등퇴장을 거듭할 따름인데, 연극 ‘햄릿’을 보면서 한 배우의 범상치 않은 행로를 실감했다.
어찌 보아 세상이란 큰 무대에선 ‘장관의 길’과 ‘배우의 길’이 같은 길인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모두가 배우인 마당에서 말이다. 여하튼 무게를 단다면 어느 쪽이 더 나갈지 모르겠으나 장관의 길은 이미 지나온 길, 배우 유인촌을 연극의 길에서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족탈불급의 경지를 ‘햄릿 유인촌’은 보여 주었고, 그래서 그 소중한 배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2016-08-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