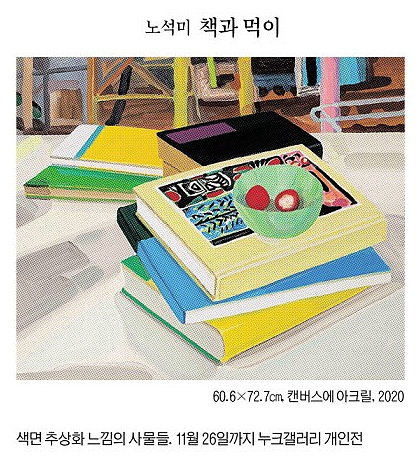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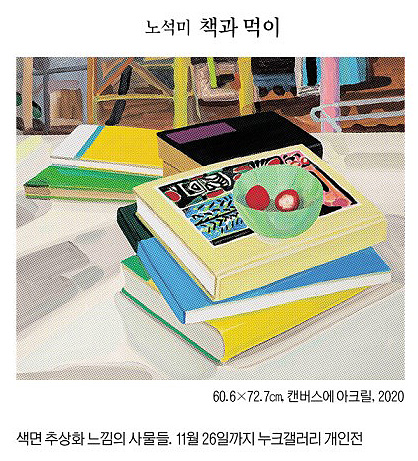
반야사 앞 냇가에 돌탑을 세운다
세상 반듯하기만 한 돌은 없어서
쌓이면서 탑은 자주 중심을 잃는다
모난 부분은 움푹한 부분에 맞추고
큰 것과 작은 것 순서를 맞추면서
쓰러지지 않게 틀을 잡아 보아도
돌과 돌 사이 어쩔 수 없는 틈이
순간순간 탑신의 불안을 흔든다
이제 인연 하나 더 쌓는 일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벌어진 틈마다
잔돌 괴는 일이 중요함을 안다
중심은 사소한 마음들이 받칠 때
흔들리지 않는 탑으로 서는 것
버리고만 싶던 내 몸도 살짝
저 빈틈에 끼워 넣고 보면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층층이 쌓인 돌탑에 멀리
풍경 소리가 날아와서 앉는다
나 사는 강 마을 가까이 선암사가 있다. 10월 초중순의 선암사는 은목서의 꽃향기로 천국이 된다. 은목서는 만리향으로 불리는데 꽃향기가 만리 밖 마을까지 날아간다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은목서 꽃향기 속에 앉아 ‘풀의 향기’라는 책을 한 시간쯤 읽다 계곡에 작은 돌탑을 쌓는다. 돌탑을 쌓을 때 작은 돌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돌탑에서 향기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벌어진 틈마다 잔돌 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순 너머의 일이거니와 한번 얼크러진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엮는 것 인간으로서 제일 힘들다.
곽재구 시인
2020-10-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