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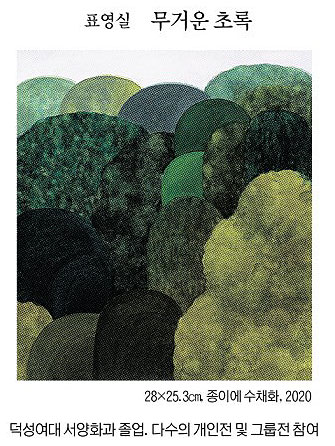
내 결코 보지 못하리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단물 흐르는 대지의 가슴에
입을 대고 젖을 빠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바라보며
잎 무성한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무
눈은 품 안에 쌓이고
비와 정답게 어울려 사는 나무
시는 나 같은 바보가 만들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느님뿐
수양버들 나무를 좋아한다. 봄이 되면 수양버들 나무는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꽃은 노란빛이 깃든 연두색인데 수양버들 꽃을 아는 이 드물다. 꽃이 지고, 가지에 새잎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면 수양버들은 자신만의 마법을 펼치기 시작한다. 칭칭 늘어진 가지가 강물과 만나는 것이다. 가지는 강물을 가만히 쓰다듬고 강물은 가지 주위에 동그란 은파를 새긴다. 겨울을 이겨 낸 두 존재가 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애틋하다. 여름날 둘이 만든 은파 주위엔 소금쟁이들이 모여 논다. 나는 가끔 소금쟁이가 되어 강물을 쓰다듬는 수양버들 가지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진다.
곽재구 시인
2020-05-0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