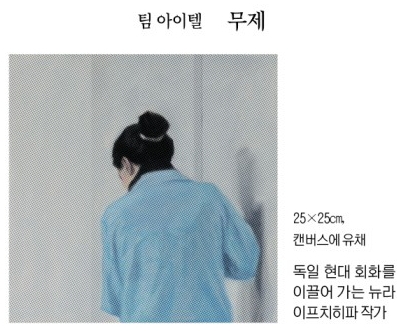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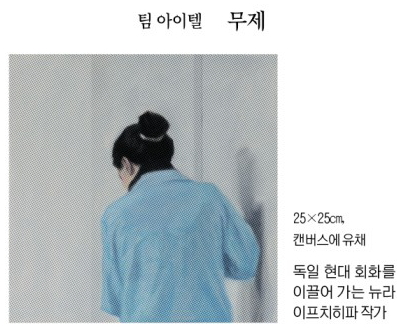
그 여자는
살아 있을 때 죽은 여자 같더니
죽고 나선 산 여자처럼
밤의 정원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는 작은 새처럼
밤하늘을 떠다니는 검은 연처럼
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생겨나고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생겨나고
모자를 쓰면 머리가 생겨난다
책을 읽으면 눈이 생겨나고
음악을 들을 땐 귀가 생겨나고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입술이 생겨나는데
그 여자는
살아 있을 때도
죽어서도 입이 있어도
말은 못 한다
-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습니다. 여자는 밤의 정원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작은 새 같습니다. 여자가 하는 일은 죽어서나 살아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장갑을 끼면서는 손가락을 사랑하지요. 양말을 신을 때면 발가락을 사랑해요. 책을 읽을 때면 눈을 사랑하고 음악을 들을 때면 귀를 사랑해요.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면 입술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으므로 삶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죽음은 사과향이 나는 그늘을 지닐 것입니다. 내게 그 말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곽재구 시인
2019-01-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