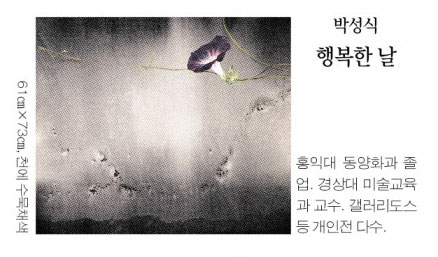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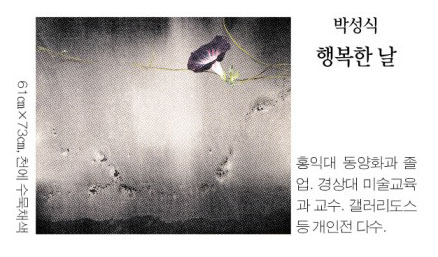
지금 여기가 맨 앞/이문재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듬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기억 그리움 고독 절망 눈물 분노도
꿈 희망 공감 연민 연대도 사랑도
역사 시대 문명 진화 지구 우주도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나는 한때 나무를 보며 이런 상상을 하곤 했다. 나무는 아주 열심히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얼음!’ 하고 외쳐서 그만 제자리에 서 버린 것은 아닐까? 침묵이 흐르고 먼지가 쌓이고 발이 땅속 깊이 뿌리처럼 묻히고, 머리카락을 바람에 잎사귀처럼 맡겨 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것을 제 습성으로 가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이 시를 읽고 새삼 깨닫게 된 것은, 나무가 늘 달리고 있었다거나 매순간이 치열한 싸움의 시작과 끝이라거나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있다는 식의 새삼스런 각성이 아니다. 어려서 아름답고 몰라서 빛나는 순간을 빼앗아 버리는 현실의 잔혹함 같은 것이다. 매일매일 역사의 마지막 장이자 첫 장으로 펼쳐지는 뉴스에 대한 서글픔 같은 것이다. 그러나 ‘땡땡땡’ 햇살이 종소리를 울리는 봄이 오면, 나무는 정말 그 깊은 발을 빼서는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신용목 시인
2017-0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