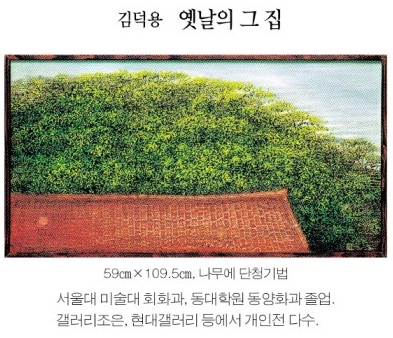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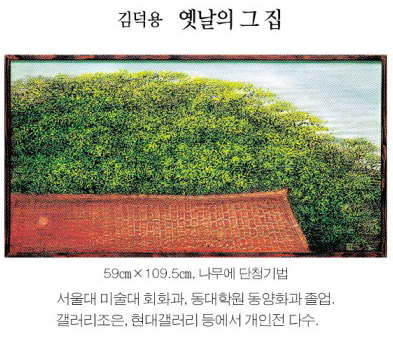
귓가에 조릿대 잎새 서걱대는 소리 들린다
이 소리를 언제 들었던가
찬 건넛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자매가 가끔 소곤대고 있다
부엌에는 한알 전구가 켜져 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어머니는 조리로 아침쌀을 일고 있다
겨울바람은 가난한 가족을 맴돌며 핥고 있다
눈밭에 젖어 밤새 언 운동화를 부뚜막에 올려놓고 군불을 때던 어머니가 있었다. 밥이 익을 즈음이면 그도 뽀송하게 다 말라서, 신으면 꼭 고두밥을 한 숟갈 떠 넣은 것 같았다. 세밑 찬바람에 자주 볼이 트고 입술이 갈라졌지만 누이의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도 서럽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었고 옷이었던 때, 부엌에 켜 놓은 알전구 같았던 때, 조릿대에게도 함께 서걱이는 가족이 있었다.
문태준의 시는 옛일을 그리는 듯하지만 언제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속절없이 우리 삶을 방문할 때, 말없이 시린 손을 이끌어 군불 도는 아랫목에 누이고 풀 먹인 마음처럼 이불을 덮어 준다. 한숨 푹 자렴. 귓가에 소곤댄다. 혼자 한 해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지만 어디에서든 마음만은 우글거리고 있을 줄 안다. 그들을 하나하나 다 부르느라 그리움이 더 바빠졌겠다.
신용목 시인
2016-12-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