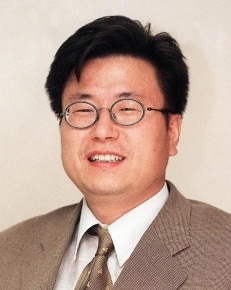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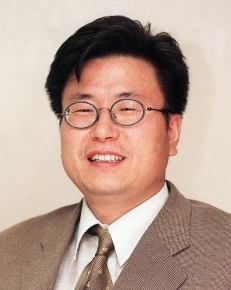
오일만 논설위원
이유는 간단하다. 인류의 먼 조상(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 대략 500만년 전에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후 499만년 동안 원시적인 수렵 생활을 해 왔다. 1만년 전에야 비로소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일을 시작했다. 그 1만년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현대인에게 관심을 받는 것은 겨우 50년도 안 된다. 인류 역사의 99.99% 시간을 근육활동 위주의 수렵 생활에 길들여진 인간들에게 현대의 문명생활은 매우 이질적이다. 적응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봐야 한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스트레스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스 셀리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인간의 몸 상태를 ‘일반적응 증후군’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1단계는 우리 몸의 자원을 총동원해 방어를 위해 노력한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큰 나무에 불이 잘 붙지 않을 때 석유를 부으면 세차게 불길이 올라오는 상태다.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 몸 안의 교감신경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의 능률을 극대화시킨다. 2단계는 몸이 전과 같이 민감하고 활달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보통 신경은 곤두서는데 잠은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거나 소화장애나 불면증 등이 일어나는 시기다. 마지막 단계는 캠프파이어 종료 직전 석유를 붓는 시기다. 다시 불이 붙기는커녕 그나마 남아 있는 불씨까지 꺼 버린다. 몸 안의 자원이 모두 동이 나 버린 소진기로 이때 병에 걸린다.
우리는 싫건 좋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트레스와 마주친다. 피할 수 없다면 사용법이라도 제대로 배워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현대판 생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14-11-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