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현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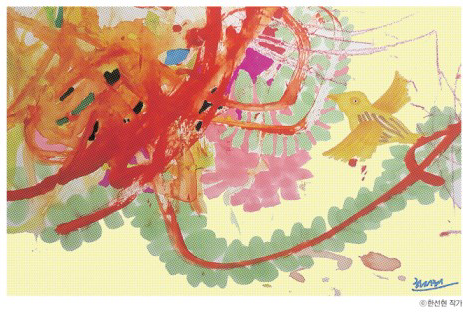
참나무 우거진 앞산에는 매일 어치 두어 마리가 방문한다. 어치는 머리가 붉고 날개깃이 푸르며 꽁지는 까만 멋쟁이다. 1970년대 대중가요 ‘산까치야’에 등장하는 산까치가 바로 어치다. 한번은 먹이를 찾고 있던 어치가 갑자기 날아오르기에 숲을 바라보았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고라니의 산책을 빨리 알아채고 어치가 다른 새들에게 경계령을 발동한 것이었다.
뒷산에서 뻐꾸기가 청명한 소리를 낼 때면 대체로 날이 맑다. 뻐꾸기는 바람이 불거나 흐린 날에는 잘 울지 않는 것 같다.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면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의탁해서 부화하는 그들의 뻔뻔한 습성도 눈감아 주고 싶어진다. 해가 질 무렵이면 검은등뻐꾸기 소리가 초여름의 초록 사이로 들려온다. 공중을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땅에 흩뿌리는 모습도 본 적 있다. 검은등뻐꾸기가 만들어 내는 4음절의 규칙적인 울음소리를 두고 짓궂은 이들이 ‘홀딱벗고’로 흉내를 낸 까닭이 궁금해진다. 그 흉내가 민망해서 어떤 이들은 ‘쪽빡깨고’로 다르게 흉내를 내었을 것이다.
마당을 가로질러 꿩이 날아가는 일이나 연못에서 목욕하던 참새들이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찔레덩굴 속으로 스며드는 일, 그리고 까치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러 오는 일은 이제 늘 겪는 일상이 됐다. 연못에 풀어놓은 잉어를 수색하기 위해 강변에 살던 검은 오리 두 마리가 새벽에 찾아오는 일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다.
창고를 짓고 대충 짐을 정리한 뒤에 한동안 문을 달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창고에 세워 둔 책꽂이 안쪽이 매우 안전한 곳인 줄 알고 딱새가 둥지를 짓고 거기에 알 네 개를 낳아 놓은 것이었다. 어설프게 창고 문을 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나는 딱새 둥지를 발견했다. 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알을 품으러 오던 딱새 어미들이 굳게 닫힌 문 주변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얘들아, 내가 큰 죄를 졌다. 나는 알이 든 둥지를 창고 바깥 울타리 위로 옮겼다. 늦었지만 이것들의 어미가 와서 멀리서 바라보기라도 하라고.
또 있다. 며칠 전 이른 아침에 베란다 유리에 무언가 강하게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새였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왔는지 유리창에 새털이 몇 붙어 있었고, 새는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었다. 몸집이 손바닥보다 큰 새였는데 조류도감에서 본 개똥지빠귀가 아닌가 싶었다. 봄에는 굴뚝새가 유리창에 부딪쳐 까무러쳤다가 겨우 날아간 적도 있었다. 유리창이 허공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그만 참변을 당한 새 앞에서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새가 다니는 길목에 집이라는 공간을 세운 내 잘못 때문이었다. 나는 뒷산에 새를 묻으며 또 자책했다. 이름을 붙이고 살면서도 죽은 새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는 나는 몽매한 인간이었으므로.
내가 사는 골짜기의 제일 높은 허공에는 솔개로 추정되는 맹금류가 있다.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얼마나 위엄이 당당한지 나는 한 마리 병아리가 돼 그를 올려다본다. 그의 이름이 솔개인지 말똥가리인지 매인지 조롱이인지도 모르면서. 이제부터라도 새소리를 듣는 행복을 누리는 만큼 새들의 이름과 거처와 안부를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20-06-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