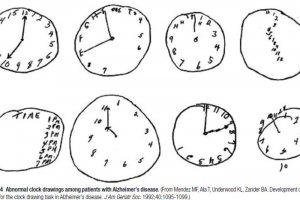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애초 모습과 다른 껍데기만 남은 제도”
유급(有給)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둘러싼 진통이 그치지 않은 건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는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이다.타임오프제는 지난해 노·사·정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안으로 처음 제안됐다. 노·사·정이 전임자 무임금제의 대안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정 제도로서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타임오프는 애초 제안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껍데기만 남은 제도”라고 비판한다.
특히 유급처리할 업무 범위를 규정했던 공익위원 안과는 달리 현 제도는 적용시간(인원)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현장의 노·사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노동학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 규모가 같은 기업이라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요는 다를 수 있는데 현행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유급 전임자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일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공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노조 사무실 또한 분산돼 있다면 조합 업무를 챙길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급 전임자의 법적 상한선을 정한 것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선진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타임오프 하한선을 정한 경우는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상한선을 정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전임자 임금 지급은 법이 아닌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제도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고쳐나가겠다고 한 만큼 산업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 4월 타임오프 한도 확정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노조에 가중치를 주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소장은 “전임자 수의 대폭 축소로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노조의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자판기 운영권 등 복지사업권을 얻어 노조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