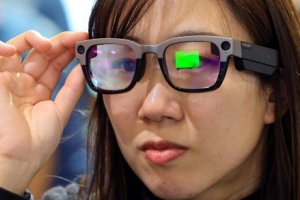김소라 산업부 기자
네이버가 국내 웹툰을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NHN엔터테인먼트의 웹툰 플랫폼 ‘코미코’가 일본과 대만, 태국, 중국에 상륙하는 등 ‘웹툰 한류’의 확산 속도도 가파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해매체’ 취급을 받았던 만화가 이제는 문화 콘텐츠의 보고(寶庫)로 자리잡은 것이다.
‘선정적인 하위문화’라는 오명과 규제의 칼날은 만화의 뒤를 이어 게임으로 향했다. 2011년 ‘셧다운제’ 도입을 기점으로 게임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게임이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되는가 하면 매출의 일부를 게임중독 치유 기금으로 징수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국내 게임업계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2012년 10% 성장률을 기록했던 국내 게임산업은 2014년 2.6% 성장하는 데 그쳤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새 게임업체는 30%, 종사자 수는 20% 가까이 줄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게임 진흥’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은 엇박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의 규제 완화와 육성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게임업계의 수출액은 29억 738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6.4%를 차지한다. 게임산업의 부가가치액은 4조 7111억원(12.5%)으로 음악(1조 7647억원)과 영화(1조 5333억원)의 세 배에 이른다. ‘게임 강국 코리아’의 힘은 여전하지만 업계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은 텐센트 등 현지의 정보기술(IT) 거인들의 손을 잡지 않으면 발도 내딛지 못한다.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VR 게임 등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 앞서 나가고 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고 문체부의 게임 진흥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면서 게임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고쳐 나가는 건 물론이지만, 게임업계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설익은 청사진’만 넘쳐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국내 웹툰의 성공 비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저기서 ‘K 웹툰 육성’과 같은 구호들이 넘쳐나지만, 지금의 웹툰 생태계는 정부의 거창한 육성 정책에 힘입은 것이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젊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세계를 펼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게임업계에 필요한 것 역시 젊은 IT 인재들이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일일 것이다.
sora@seoul.co.kr
2016-06-0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