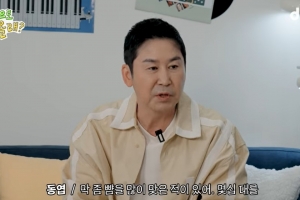얼어붙은 올림픽 유치 열기
올림픽 열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베이징과 함께 2022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된 노르웨이 오슬로가 석 달 뒤 대회 유치를 포기했다. 알마티와 베이징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동계올림픽은 2018 평창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아시아에서 열린다. 2020 도쿄올림픽까지 더하면 4년 사이 3개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모두 아시아에서 펼쳐진다.2008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이 유치에 성공하면 동계와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유일한 도시가 된다. 당초 유치전에 뛰어들 것을 검토하던 스웨덴 스톡홀름과 폴란드 크라쿠프, 독일 뮌헨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유치 희망을 철회했다.
‘아시아의 잔치’가 아니라 아시아에 짐을 떠넘겼다고 보는 게 옳겠다. 국력을 뽐내고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올림픽의 효능이 선진국에 먹히지 않은 탓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돼 막대한 개최 비용을 쏟아낼 수 없는 것도 ‘올림픽 거품’을 빼고 있다.
2004 아테네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1%, 국가부채는 GDP의 110.6%까지 치솟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 이후 40년 동안 올림픽 개최국들은 당초 예산보다 79%를 더 지출했다.
우리나라도 2002 한·일월드컵부터 2018 평창까지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들어간 국고 지원액이 승인 당시보다 3조 2000억원이나 더 지출됐다. 일단 유치해놓고 중앙정부에 떼를 써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8일 올림픽의 복수 도시 개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 올림픽 어젠다’를 발표한 것이다. 다음달 모나코 IOC 총회에서 확정되면 동계와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은 인근 도시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재팬타임스는 도쿄의 경기장 건설 비용이 당초 4800억엔(약 4조 3369억원)에서 2600억엔(약 2조 450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올림픽 운동과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IOC의 처절한 상황 인식이 어젠다에 녹아 있다.
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2014-11-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