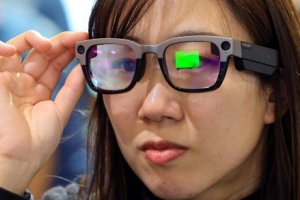벨기에 치과의사가 75시간 동안 502㎞를 달린 것이 대회 기록으로 남아 있는 미국 테네시주의 빅 독 울트라 마라톤 대회다. 개리 캔트렐(43)과 부인 산드라의 벨 버클 농장 일대 코스를 무한정 돌아야 한다. 대회 이름은 달림이들이 밤낮 없이 달리는 내내 집의 현관에서 꼼짝 않고 자는 일이 전부인 불독의 이름에서 따왔다. 별난 달림이들은 ‘피니시(결승선)가 없는 대회’라고 부른다.
캔트렐은 최근 영국 BBC와의 줌 인터뷰를 통해 “어렵지 않다. 조금 힘들 뿐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되풀이, 되풀이해야 한다. 한 대 안 맞으려면 꽁무니를 빼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2017년 우승자인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기욤 칼미테스(37)는 59시간 동안 349㎞를 달렸는데 “고통스럽다. 한데 좋은 방향으로 고통스럽다”고 여유를 부렸다. 2019년 미국인 매기 구털(40)은 402㎞를 처음으로 돌파한 여성으로 기록됐는데 “대다수 울트라 달림이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스파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잠시 텐트에 들어가 눈을 붙이거나 캠핑 스토브 옆에서 몸을 녹이는 게 고작이다. 아니면 아이스박스 위에 발을 올린 채 다리의 피로를 푸는 게 전부다.
2019년 대회 3위를 차지한 데이브 프록터(40·캐나다)는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티셔츠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달려라 먹어라 잠자라 되풀이하라’ 처음에야 응원단이 나와 열렬히 환호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대회에 지쳐 떨어져 마지막 날에는 쓸쓸히 달림이들만 즐긴다. 프록터는 “화장실 갔다가 밑도 안 닦고 나오는 이들도 있다.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뇌 기능이 딱 멈춰버린다”고 말했다.
구털은 60시간을 달린 뒤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귀가 항공편을 거의 놓칠 뻔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온다. 왜 뛰는데? 최근 3년 연속 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레이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 엄청 재미있다”고 답했다. 스웨덴 IT 기업 최고경영자(CEO) 조핸 스틴은 2018년 대회에 출전해 68시간 동안 455㎞를 달렸는데 “환상적인 규칙들이 망라된 특별한 게임”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이 대회를 연 캔트렐은 악명 높은 바클리 마라톤 대회도 창설한 인물이다. 버스에 참가자들을 태워 달리다 350마일(563㎞) 떨어진 곳에서 이쯤 됐다 싶으면 내려주고 열흘 안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회다. 돌아오는 사람은 1%에 그친다. 오죽했으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지상에서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대회로 손꼽았다. 캔트렐은 2018년에 126일 만에 미국 대륙 5149㎞를 횡단할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한다.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할텐데 참가자들이 먹는 것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그저 위가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지덕지할 따름이다. 스파게티와 감자칩, 벌꿀이 들어간 그리스식 요거트, 폴란드식 만두, 으깬 감자, 파이 등이 고작이다. 몇년 굶은 것처럼 보이는 2019년 준우승자 윌 헤이워드(뉴질랜드)는 설사 증세를 보인 끝에 구털에게 우승을 양보했다.
자는 시간을 최대한 깊게, 짧게 즐기는 게 관건이다. 스틴은 옆 사람과 재잘거리다가도 금세 잠이 깊게 들어 업어가도 모를 정도인데 또 금방 깨어나 달린다. 달리면서 나무와 관목이 공룡과 거인으로 보이는 환각도 경험한다고 다들 입을 모았다. 스틴의 조언은 너무 간단하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