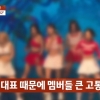뉴포커스 “가부장적 사고 때문”…‘아가씨’도 금기어


북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 기념일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조모 김정숙의 생일을 맞아 각지에서 무도회가 열렸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에서 ‘오빠’라는 별칭은 핏줄로 이어진 친혈육이나 형제처럼 가까운 지인에게만 해당되는 별칭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연인 혹은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연인이 되기 전에는 ‘OO동무’라고 부르다가 가까운 사이가 되면 ‘자기’라는 호칭을 쓴다.
북한에서 부부끼리 서로 부를 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라고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년 이상 여성은 남편을 ‘우리 나그네’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한다.
뉴포커스 인터뷰에서 탈북자 박선옥씨는 “하나원을 졸업한 탈북자들은 제일 처음 거주지 주변 하나센터에 배속돼 사회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 학습을 한다”면서 “한 번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러 간 적이 있었다. 북한에 살면서 야구경기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꽉 들어찬 경기장 분위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풀었던 기분도 잠시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옆에 앉는 젊은 여성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그녀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오빠, 파이팅’이라는 고함에 가까운 말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야구 선수의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많은 여성이 이구동성으로 ‘오빠’를 부르면서 격하게 응원했다”면서 “살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풍경이라 어안이 벙벙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시 ‘오빠 파이팅’을 부르는 여성들에 대해 병이 있다고까지 생각했었다. 북한말로 ‘신경환자’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탈북한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급속히 퍼지면서 국경지대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부장적인 사회인 북한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철없고 버릇없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탈북한 김혜옥씨는 “국경지방에 사는 우리 또래 젊은 층들은 대부분 남자친구와 대화 할 때 ‘오빠’라는 말을 거부감 없이 한다”면서 “남한드라마를 보면서 유행된 것이 젊은이들의 연애 문화에 그대로 재현됐다”고 전했다.
또 “시장이나 큰길에서 ‘오빠’라고 부르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서 “한번은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 집에 남자친구랑 함께 갔다. 식사자리가 어색한 남친을 배려해 얼떨결에 ‘오빠’라고 불렀다가 할머니한테 엄한 꾸중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유로 “결혼하면 남편이 될 사람을 버릇없이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올바른 행실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북한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연인을 부르는 별칭은 남한에 비해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정권은 개인의 사랑도 당에 충실할 때 아름답게 꽃 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면서 조국을 떠난 개인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며, 애인들 사이에도 혁명적 동지적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교양한다.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기인한 별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뉴 포커스는 “이런 문화 속에 수십 년을 살아 온 탈북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순간에 받아들이기는 역부족”이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그들 스스로가 체험하고 바꾸어 간다. 그들은 남한에 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빠’라는 별칭을 자연스럽게 부른다”고 전했다.
참고로 북한에선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실상 금기어로 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 지위가 높은 집안의 여성을 뜻하는 ‘아씨’, ’아가씨’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다. 북한 주민들은 봉건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해 이런 표현을 경멸한다. 사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아가씨’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늘면서 손 윗사람이 여성을 부를 때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만 쓰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