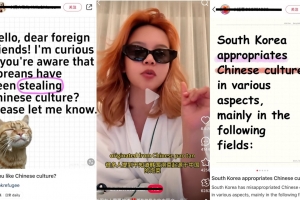헐렁망탕에 파는 엿, 말만 잘해도 거저 주는 옛 인심
엿장수 가위 소리도 사라진 풍물의 하나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을 안 골목길에서 사나흘이 멀다하고 들을 수 있었던 소리다. 그뿐 아니라 그때마다 마을 아이들은 모여들어 신바람이 났고, 더러는 입 안의 침을 몰아 꼴깍거리기도 했다.엿장수의 엿가위는 특이했다. 가위의 날이 따로 없는 민드름하고 넓적한 잎에, 가위 다리 또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다 넣어도 헐렁하게 공간이 남는 큼직한 것이었다. 엿장수는 이러한 엿가위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고, 때로는 노래와 춤을 곁들이기도 했다. 엿모판을 짊어진 채 춤을 추기도 하고, 아예 엿모판을 내려놓고 노래와 춤판을 한바탕 벌이기도 했지만 노래와 춤에 엿가위를 놓는 일은 없었다.


처녀 젖통이같이
몽실몽실 피어나는 엿
남원 광한루 대들보 같고
밀양 영남루 기둥 같고
진주 촉석루 한기둥 같구나
굵은 엿 헐한 엿
어디를 가며는 거저 주나
같은 값이면 이리 와
노래와 춤은 구성진 것이었지만 그 노래와 춤을 이끄는 듯한 가위 소리가 한결 더 멋있었다. 오른손에는 가위를 쥔 시늉을 하고 손목을 흔들어 대며 흉내를 내볼 만큼 그렇게 멋이 있었다.
찰가락 찰가락 탁
찰가락 찰가락 탁
이런 반주가 나오면 “울릉도라 호박엿 / 평창 대화 옥수수엿 / 바삭거린 창평엿”같은 노래가 나왔다.
짤칵짤칵 찰가락
짤칵짤칵 찰가락
위의 가위 소리면 “쫄깃쫄깃 찹쌀엿 / 하박하박 사탕엿 / 울퉁불퉁 대초엿 / 호콩호콩 호콩엿 / 달랑달랑 호두엿”이라는 노래가 나왔다.
엿장수는 입심도 좋았다. 주워섬기는 엿단쇠 소리 속엔 간간 상스러운 말도 끼어 있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마을 어귀로부터 울려오면 중뜸이나 윗뜸의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아래뜸으로 내닫는다. 손에는 엿과 바꿀 수 있는 고물 폐품들이 들려 있었다. 엿장수의 뒤를 졸래졸래 따르며 흥겨워하다가 엿모판을 내려놓으면 손에 든 고물들을 내민다. 헌 옷가지, 목 떨어진 숟가락총, 구멍 난 고무신짝 등이었다.
엿모판은 울긋불긋 아름다웠다. 색색의 물을 들인 산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수놓듯 놓은 모판엿이 있는가 하면 밀가루를 묻힌 하얀 가락엿도 있었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요내 엿판에 엿 떨어진다
섣달 큰 애기 개밥 퍼주듯
헐렁망탕에 파는 엿
말만 잘해도 거저 주지
엿장수의 입은 엿을 팔면서도 놀지 않는다. 가락엿을 달라면 긴 엿가래를 엿가위의 등으로 툭 쳐서 부러뜨려 주고, 모판엿을 가리키면 납작한 쇠끌 같은 것을 모판엿에 갖다 대고 엿가위 복판께로 토퍽토퍽 쳐서 떼내어 준다.
아무것도 엿과 바꿀 수 없는 아이는 엿모판의 엿이나 엿모판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엿을 바라보며 부러운 눈짓을 보낸다. 이러한 아이들의 눈길에 엿장수의 눈길이 닿으면 엿장수는 또 노래를 부른다.
사탕보다 달고 단 엿
침이 질질 흐르는 엿
하며, 모판엿을 쥐꼬리만큼 떼내어 그 아이 입에 쏙 밀어 넣어 주기도 한다.
가락엿으로 엿치기를 하기도 했다. ‘하나 둘 셋’하며 엿을 부러뜨려서 입바람을 불면 부러진 엿의 단면에 구멍이 나게 마련인데, 큰 구멍이 있는 쪽이 이긴다. 이긴 쪽은 진 쪽의 엿을 받아먹는 내기였다.
모판엿은 쇠끌로 자룸하면서도 너덜너덜하게 떼낸 것이어서 어린이의 작은 입으로 베어먹기에 좋도록 되어 있었다. 강엿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눅직한 모판엿은 입에 넣어 우물거리기가 바쁘게 목을 타고 넘어갔다. 맛 또한 조청보다 단 맛이었다.
이제는 엿장수도 그 엿장수의 가위소리도 가위춤에 곁들인 노랫소리도 흔하게 보고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옛날의 엿장수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그 생김새부터가 희극적이어야 하지만, 입담과 노래, 춤 재주도 웬만큼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엿장수는 못할 성싶다.
오늘날처럼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던 옛날의 시골, 마을 골목에 엿장수가 들어서면 아이들은 물론 아낙네들까지도 담 너머로 눈길을 보내는 한바탕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거기엔 뭔가 낭만적인 멋이 있었다.
글·사진_ 최승범 수필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