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살이라 손가락질 않길”… 두 에세이 출간

웨일북 제공

이다울 작가는 어느 날 느닷없이 까닭 없는 고통이 엄습한 삶을 솔직하게 써 내려간 에세이를 출간했다.
웨일북 제공
웨일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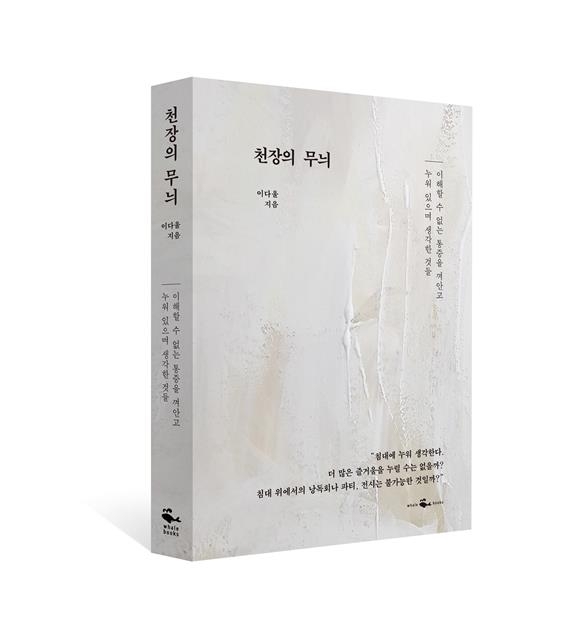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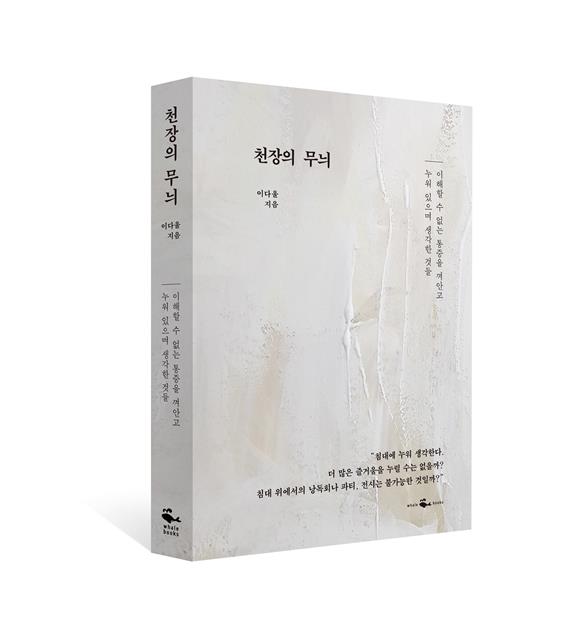
작가는 한기에 예민한 통증을 유난스럽게 생각하는 엄마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탓에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조차 연습이 필요하다. 통증은 식욕의 부재와 우울감을 불러오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구분을 만들어 간다. 침대에 누워서는 아픔과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낭독회와 전시회를 상상한다. ‘천장의 무늬’라는 제목에는 그가 침대에 누워 있으며 보냈을 그 시간과 공간, 불안과 상상이 얼룩져 있다.
강이람 작가의 ‘아무튼, 반려병’(제철소)은 16년 차 직장인으로서 겪은 ‘잔병치레의 역사’다. 잔병이 만든 ‘수동태의 역사’와 더불어 아픔의 틈새를 건드리는 게 특징이다. 작가에겐 소위 ‘저질 체력’, ‘약골’,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등의 별명이 붙었다. 첫 직장에서는 폭음으로 숙취와 각종 위장병을 얻었고, 과로에 시달렸던 두 번째 직장에서는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 긴 재활치료 끝에 사직서를 내는 그에게 두 번째 직장의 본부장은 말한다. “너 일이 싫은 건 아니잖아? 라꾸라꾸침대 놔 줄 테니 중간중간 누워서 일해.”(24쪽)

제철소 제공

강이람 작가는 16년 차 직장인의 크고 작은 잔병치레 역사를 솔직하게 써 내려간 에세이를 출간했다.
제철소 제공
제철소 제공


책들은 나의 아픔과 타인의 아픔을 함께 경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천장의 무늬’에 적힌 집필 계기가 주는 울림이 크다.
‘이 책은 억울함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몸과 아픔이 납작해지는 것을 구해 내려는 시도에서였다. (중략) 모두의 아픔이 보다 자세히 말해졌으면 좋겠다. 엄살이라는 말이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고 말하고 듣는 일이 원활해졌으면 한다.’(5~6쪽)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0-11-16 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