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글쓰기’ 이남희·김별아 신작소설 동시출간
문학은 간절한 구원의 몸짓이다. 상처가 없이는 문학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느냐, 비스듬히 비켜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개인에게도, 집단에도 마찬가지다. 소설가 이남희와 김별아가 나란히 책을 냈다. 소설 또는 수필로 형식은 달리했지만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구원의 글쓰기, 치유의 글쓰기를 펼쳐낸 점은 한 가지 모습이다.[친구와 그 옆 사람] 이남희 지음 실천문학 펴냄
모든 문학은 ‘치유하는 글쓰기’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쉬 극복하지 못한 채 쌓이고 쌓여 왔던 콤플렉스는 역설적으로 열등감과 결핍감을 메워주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또 몸과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대충 반창고로 가려두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름의 끝이 어디인지 아예 손가락 집어넣어 후벼파는 것으로 치유의 방법을 삼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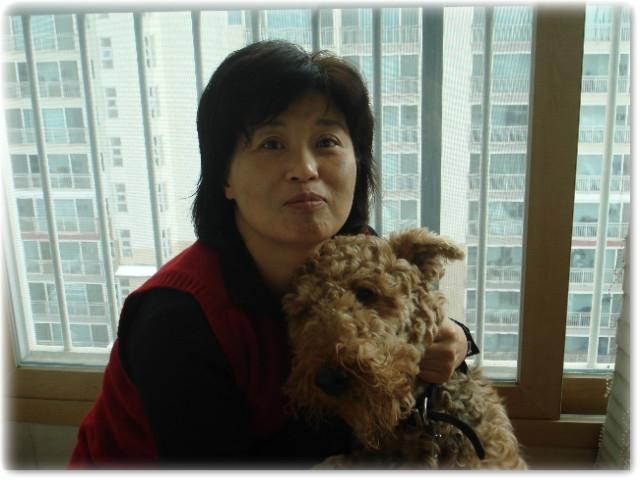
실천문학 제공

애완견과 함께 한 이남희
실천문학 제공
실천문학 제공
●페미니즘 영 역서 새 소설 세계 구축
중견소설가 이남희(53)의 새 소설집 ‘친구와 그 옆 사람’(실천문학 펴냄)은 과감히 상처를 직면하고 헤집는 편을 택하고 있다. 한 편의 중편과 여섯 편의 단편으로 이뤄진 소설집은 1980~1990년대 리얼리즘으로 세상과 맞서던 이남희가 페미니즘의 영역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소설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증명시킨다.
모든 작품의 화자는 여성이다. 표제작인 중편소설 ‘친구와 그 옆 사람’은 이남희 소설 세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작품이다.
리얼리즘을 틀어쥐고 소설과 대면해 오던 이남희는 이제 실체조차 의심되는, 상실된 1980년대 혁명의 꿈을 되새기는 한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려봤던 소박한 행복, 붙잡을 수 없는 사랑의 부질없음을 혼자 사는 여자 ‘영우’를 통해 발화하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연하남 김환에게 사랑을 구걸하듯 얽매이는 처지는 20세기와 21세기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남희의 모습과 다름없다.
●불안·혼돈의 심리 세밀하게 묘사
단편에서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세 번째 여자’의 은정이, ‘낯선 이들의 집’의 정남이, ‘빛의 제국’의 그녀 등은 모두 이혼한 채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지만 다양한 이유의 상처로 인해 거듭 배신당하고, 더 큰 상처를 안은 채 스스로 갈무리짓고 만다. 유년 시절 아버지, 이웃의 남자 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폭력은 ‘어두운 층계 위’나 ‘거미집’에서 정밀히 묘사된다. 읽는 이, 아니 그보다 쓰는 이의 불편함이 더욱 크겠지만 고개를 외로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낯선 이들의 집’ 등을 통해 남녀의 우정 또는 동성애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관계의 또 다른 형태를 모색한다.
꿈을 잃어버린, 깊은 상처를 가진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자잘한 곳까지 마음 쓰는 이남희의 문체와 언어가 제격이다. 규정짓기 어려운 불안과 혼돈의 심리도, 스쳐 지날 법한 찰나의 상황조차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만 숨이 막힐 정도로 스스로를 가둬놓는 여리고 섬세한 언어나, 전편에 걸쳐 태연한 표정으로 상처를 헤집고 다니는 인물들의 상황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허나 어쩌랴. 그것 또한 치유의 방법이니 말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이또한 지나가리라!] 김별아 지음 에코의서재 펴냄
학창시절 10년 동안 줄곧 반장을 지내는 등 모두가 부러워하는 ‘엄친딸’이었지만 사실 일기장에는 ‘죽음과 죽임’만을 반복해서 적었던 ‘소아 우울증’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백한다.

에코의서재 제공

‘대간꾼’으로 변신한 김별아
에코의서재 제공
에코의서재 제공
또한 살과 피와 뼈를 내줬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아이를 길러줬건만 ‘감히’ 대들거나 숫제 투명인간 취급받기 일쑤인 어미임을 아파한다. 늘 지혜롭고 완벽하기를 추구했던 성격은 또 다른 결핍과 욕망을 불러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평지형 인간’의 백두대간 산행기
‘평지형 인간’을 자처하는 소설가 김별아(42)가 쓴 산문집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코의서재 펴냄)는 굳이 분류하자면 일종의 산행기다. 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의 아이들, 학부모들과 함께 백두대간 동아리에 들어가 격주로 백두대간의 한 구간씩 오르내리며 느끼고 겪은 부분을 기록한 글이다.
한번 산을 타면 열 시간 안팎의 시간에 15~20㎞씩 가야 한다. 이렇게 무려 40곳을 지나야 비로소 백두대간 완주가 된다.
지난해 3월 13일 전북 남원에서 대간꾼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뒤 모두 열여섯 구간을 진행한 김별아가 남긴 중간보고서 격의 산행기다.
암벽을 네발로 기어오르며 말로만 떠들던 죽음의 공포를 실제로 느끼기도 하고, 헤드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강풍에 후들거리며 마루금을 걷고, 쏟아지는 비에 쫄딱 젖어가며 산을 오르는 얘기는 함께 주먹을 꽉 쥐게 만들고 허벅지 근육을 팽팽하게 만든다. 하지만 김별아가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처의 치유’에 있다.
그는 산을 타는 이야기만큼이나, 그보다 훨씬 공을 들여 오랜 시간 자신 안에 품어왔던 상처와 콤플렉스를 털어놓는다. 산을 타기 전에 자신 안에 쌓여 있고 자신을 움직였던 에너지의 원천이 분노와 집착, 증오, 결백임을 확인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다.
●진정한 사랑에 터잡은 구원·치유의 글
김별아는 “이 책은 산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이야기”라고 적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받은 상처는 결국 자연이 치유해 준다.”고 덧붙였다.
문득 괜한 걱정이 든다. 김별아가 너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닌가. 김별아 안의 결핍과 상처, 불안, 긴장, 슬픔,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면의 불 같은 갈등이 없이도 소설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온화하게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착한 소설’만 쏟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터를 잡으면 치유의 글쓰기도, 문학을 통한 또 다른 구원도 나올 터다. 접어야 할 쓸데없는 걱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4-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