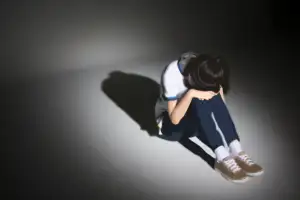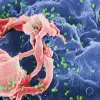한국미술 중국시장 진출 성적은
중국이 전 세계 미술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베이징은 10여개의 한국 갤러리들로 붐볐다. 불과 2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 기이할 정도로 많은 갤러리들이 중국시장을 노크했다. 하지만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로 상황이 돌변했다. 거친 변화의 터널을 지나 살아남은 한국 갤러리들은 서너 곳에 불과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모양새였다.현재 중국 미술계의 심장으로 불리는 베이징 왕징 서쪽 ‘주창 예술구’에선 더 이상 한국 화랑을 찾아볼 수 없다. 인근 ‘798 예술지구’로 규모를 줄여 옮기거나 중국 사업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시 내용도 달라졌다. 진출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한국 대가들의 전시가 잇따라 열렸으나 지금은 중국과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주로 소개하는 정도다.
쇠퇴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미술 관련 정책이 자리한다. 중국 정부는 2012년까지 수입관세, 영업세, 소비세 등 미술작품 가격의 41%를 세금으로 매겼다. 갤러리들은 서류상으로 작품을 싸게 들여와 수익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중국 정부가 세금의 폭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신 대대적인 예술품 가치 검사를 병행하자 경영이 악화됐다.
중국 미술시장 전문가인 서진수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턱대고 진출했던 일부 한국 화랑들의 잘못도 크지만 중국 미술 컬렉터들이 자국 미술품에만 집착하는 경향도 무시할 없다”고 말했다.
중국 ‘슈퍼리치’들이 앞다퉈 소더비 등의 미술 경매에서 자국 작가들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동안 한국 미술시장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쟝사오강, 팡리쥔, 마류밍 등 1950~1960년대 출생 작가들이 명성을 쌓는 동안 한발 앞서 서구 미술계에 진출한 한국 작가들은 여전히 미술시장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 중국 미술시장에선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박여숙화랑, 샘터화랑 등이 진출했다가 철수한 상하이에 지난해 12월 학고재갤러리가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최근에는 아라리오갤러리가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자리를 옮겼다. 그 배경에는 한국 미술이 ‘K팝’ 못지않은 ‘K아트’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윤재갑 상하이 하오아트뮤지엄 관장은 “지금의 중국은 정치·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관용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어 한국 미술을 전파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항저우(중국)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9-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