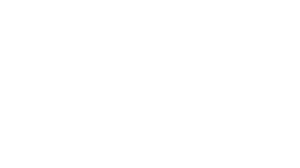лђімЫРмєЩ мЛђмВђ¬ЈмЭЉл≥Є кЄ∞л≤Х м±ДнЩФмє†мЮ• мЭШнШєвА¶ лґИнИђл™ЕнХЬ мД†м†Х л∞©мЛЭ лПДлІИмЧР
мІАлВЬлЛђ мДЬмЪЄ мЧђмЭШлПД кµ≠нЪМмЭШмВђлЛємЭШ кµ≠м†Хк∞РмВђмЮ•. мЬ§кіАмДЭ лѓЉм£ЉлЛє мЭШмЫРмЭі л™©мЖМл¶ђл•Љ лЖТмШАлЛ§. лђЄнЩФмЮђм≤≠мЭі м±ДнЩФмє†мЮ• м§СмЪФлђінШХлђЄнЩФмЮђ(мЭЄк∞ДлђЄнЩФмЮђ)л•Љ мІАм†Х мШИк≥†нХШлКФ к≥Љм†ХмЧРмДЬ лґИк≥µм†ХнХЬ кЄ∞лЯЙ нПЙк∞АмЩА кіАл¶ђ к∞РлПЕ мЖМнЩА, мЭЉл≥Є кЄ∞л≤Х мВђмЪ© мЭШнШє лУ±мЭі лґИк±∞м°МлЛ§лКФ мІИнГАмШАлЛ§. вАЬм°∞мВђлЛ®мЭД кЊЄл†§ мІДмГБмЭД нММмХЕнХімХЉ нХЬлЛ§вАЭлКФ м£ЉмЮ•мЧР лђЄнЩФмЮђм≤≠мЮ•мЭА вАШм†Дл©і м°∞мВђвАЩлЭЉлКФ кЈємХљ м≤Шл∞©мЭД лВілЖУмХШлЛ§. мЭіл†ЗлУѓ мІАлВЬ 9мЫФ мШИм†ХлРРлНШ м±ДнЩФмє†мЮ• мЭЄк∞ДлђЄнЩФмЮђ мµЬмҐЕ мІАм†ХмЭА лСР м∞®л°АлВШ мЧ∞кЄ∞лРШл©імДЬ лЛ§мЭМ лЛђл°Ь лѓЄл§ДмІАлКФ лУ± нММнЦЙмЭД к≤™к≥† мЮИлЛ§.мЪ∞л¶ђмЭШ к≥†мЬ† лђЄнЩФ мЮРмВ∞мЬЉл°Ь к≥ДмКє, л∞Ьм†ДлПЉмХЉ нХ† лђінШХлђЄнЩФмЮђл•Љ лЖУк≥† мЮ°мЭМмЭі лБКмЭімІА мХКк≥† мЮИлЛ§. 5лЕДмЧђмЭШ м†ДнЖµ л≥µмЫР к≥Љм†ХмЭД к±∞мєШк≥†лПД лЕЉлЮАмЧР лє†мІД мИ≠л°АлђЄ мВђнГЬ л™їмІАмХКк≤М лђЉл∞СмЧРмД† лКШ нММмЮ•мЭі нБђлЛ§. мЭЄк∞ДлђЄнЩФмЮђл•Љ мІАм†ХнХ† лХМлІИлЛ§ к±∞мЭШ мЦікєАмЧЖмЭі мЭШнШємЭі м†ЬкЄ∞лРШк≥† мЮИлКФ нШДмЛ§мЭілЛ§. мµЬкЈЉмЭШ мЮ°мЭМмЭА м±ДнЩФмє†мЮ•к≥Љ кіА놮лРЬ к≤ГмЭілЛ§. лђЄнЩФмЮђм≤≠мЭі мІАлВЬ 7мЫФ AмФ®л•Љ вАШм±ДнЩФмє†мЮ• мЭЄк∞ДлђЄнЩФмЮђвАЩл°Ь мЭЄм†Х мШИк≥†нХШл©імДЬ кЄ∞лЯЙ мЛђмВђ кЄ∞к∞Д лКШл¶ђкЄ∞, мЛђмВђмЬДмЫР нКєм†Х лМАнХЩ мґЬмЛ† нОЄм§С лУ± к≥µм†ХмД± мЛЬлєДк∞А лґИк±∞м°МлЛ§. AмФ®к∞А мЭЉл≥Є кЄ∞л≤ХмЭЄ вАШлЛ§мєілІИнВ§мЧРвАЩл•Љ мВђмЪ©нЦИлЛ§лКФ мЭШнШєкєМмІА мЭЉл©імДЬ нММмЮ•мЭА мї§м°МлЛ§.
лђЄнЩФмЮђм≤≠ м∞®мЮ•кєМмІА лВШмДЬ мЛђмВђ к≥Љм†ХмЭД мЭЉмїђмЦі вАЬлђінШХлђЄнЩФмЮђ м†ЬлПДмЭШ кЈЉк∞ДмЭі нЭФлУ§л¶і мИШ мЮИлКФ лђЄм†ЬвАЭлЭЉк≥† нСЬнШДнЦИлЛ§. лђЄнЩФмЮђмЬДмЫРнЪМмЧРмДЬ мЦілЦ§ нМРлЛ®мЭД лВіл¶імІАлКФ лСРк≥† ліРмХЉ нХШмІАлІМ мЛ†лҐ∞мД±мЧР м†БмЮЦмЭі нГАк≤©мЭД л∞ЫмЭА к≤ГмЭА мВђмЛ§мЭілЛ§.
2010лЕДмЧРлПД мЭЄк∞ДлђЄнЩФмЮђмЭЄ вАШмЖМл™©мЮ•вАЩ л≥імЬ†мЮР мІАм†Хк≥Љ кіА놮нХі лЕЉлЮАмЭі мЭЉмЧИлЛ§. нХЬ м∞®л°А лґАм†Бк≤© мЭШк≤ђмЭі м†ЬмЛЬлРЬ мЭЄмВђк∞А мД†м†ХлРЬ м†Р, мЖМл™©мЮ•мЭШ л≤ФмЬДл•Љ мЦілЦїк≤М л≥Љ к≤ГмЭілГР лУ±мЭі мЛЬлєЧк±∞л¶ђл°Ь лЦ†мШђлЮРлЛ§. лЛємЛЬ лђЄнЩФмЮђм≤≠мЭА м†ДлђЄк∞АмЬДмЫРнЪМл•Љ кµђмД±нХі нЫДл≥і 8л™ЕмЭД мД†м†ХнХЬ лТ§ BмФ®л•Љ л≥імЬ†мЮРл°Ь мµЬмҐЕ мІАм†ХнЦИлЛ§. нХШмІАлІМ нКєм†Х кЄ∞л≤ХмЭД м†ДмИШл∞ЫмЭА мЮ•мЭЄмЭілЭЉкЄ∞л≥ілЛ§лКФ вАШнШДлМАм†БвАЩ м°∞нШХ к∞Рк∞БмЬЉл°Ь к≥†к∞Акµђл•Љ мЧ∞кµђ, л≥µм†ЬнХі мШ® мЮСк∞А к≤Є мВђмЧЕк∞АлЭЉлКФ м†РмЭі лђЄм†Ьк∞А лРРлЛ§. нГИлЭљмЮРлУ§мЭА вАЬлђімЫРмєЩ мЛђмВђл•Љ лМАл≥АнХШлКФ к≤ГвАЭмЭілЭЉк≥† л™©мЖМл¶ђл•Љ лЖТмШАлЛ§.
к∞АмЮ• мґФмХЕнХЬ лЛ§нИЉмЭА 2002лЕД лђЄнЩФмЮђм≤≠ мІБмЫРмЭі вАШл™©м°∞к∞БмЮ•вАЩ л≥імЬ†мЮРмЭЄ CмФ®мЧРк≤М вАЬк≥µмШИк≥ДмЧРмДЬ лІ§мЮ•мЛЬнВ§к≤†лЛ§вАЭлКФ нШСл∞Х нОЄмІАл•Љ л≥ілВіл©імДЬ л≤МмЦім°МлЛ§. CмФ®мЧР мЭімЦі DмФ®к∞А л™©м°∞к∞БмЮ• л≥імЬ†мЮРл°Ь мІАм†Х мШИк≥†лРШл©імДЬ мЧЕк≥ДмЧРмД† мЮРк≤©к≥Љ мД†м†Х м†Им∞®л•Љ лђЄм†Ь мВЉлКФ л™©мЖМл¶ђк∞А мї§мІД мГБнГЬмШАлЛ§. к≤љм∞∞мЧРкєМмІА лѓЉмЫРмЭі м†ЬкЄ∞лРРк≥† нХілЛє лђЄнЩФмЮђм≤≠ мІБмЫРмЭА CмФ®л•Љ мЭШмЛђнЦИлЛ§. мЭілУ§мЭШ лЛ§нИЉмЭА л≤Хм†Хк≥µл∞©мЬЉл°Ь лєДнЩФлРРлЛ§. л≤ХмЫРмЭА 2003лЕД CмФ®мЧРк≤М л™ЕмШИнЫЉмЖРмЬЉл°Ь мІХмЧ≠ 8к∞ЬмЫФмЧР мІСнЦЙмЬ†мШИ 2лЕДмЭШ мЛ§нШХмЭД мД†к≥†нЦИлЛ§. мЭілУђнХі лђЄнЩФмЮђм≤≠мЭА мЖНм†ДмЖНк≤∞л°Ь CмФ®мЭШ мЭЄк∞ДлђЄнЩФмЮђ мЮРк≤©мЭД л∞ХнГИнЦИлЛ§. нХШмІАлІМ 7лЕД лТ§ л≤ХмЫРмЭА лЛ§мЛЬ CмФ®мЭШ мЦµмЪЄнХ®мЭД нТАмЦім§ђлЛ§. CмФ®к∞А мЭЄк∞ДлђЄнЩФмЮђ мІАмЬДл•Љ л∞ХнГИлЛєнХЬ м≤Ђ л≤ИмІЄ мЮ•мЭЄмЭілЮА лґИл™ЕмШИл•Љ мХИмЭА лТ§мШАлЛ§.
лђінШХлђЄнЩФмЮђлКФ мЧ∞кЈє, мЭМмХЕ, лђімЪ©, к≥µмШИкЄ∞мИ† лУ± лђінШХмЭШ лђЄнЩФм†Б мЖМмВ∞мЬЉл°Ь м†ХмЭШлРЬлЛ§(лђЄнЩФмЮђл≥інШЄл≤Х 2м°∞). лђінШХлђЄнЩФмЮђмЧР мІАм†ХлПЉлПД лЛємЮ•мЭА мЮ•мЭЄлУ§мЧРк≤М нБ∞ к≤љм†Ьм†Б лПДмЫАмЭі лРШмІД мХКлКФлЛ§. мІАм†ХлРШкЄ∞ мЬДнХімД† м†ДмИШмЮ•нХЩмГЭлґАнД∞ мЭімИШмЮР, м†ДмИШкµРмЬ°м°∞кµРл•Љ к±∞м≥РмХЉ нХШлКФлН∞ кЈЄ кЄ∞к∞ДмЭі л≥інЖµ 15~20лЕД мЭімГБмЭілЛ§. мЭЄк∞ДлђЄнЩФмЮђк∞А лПЉмДЬмХЉ мЫФ 125лІМ~162лІМмЫРмЭД мІАмЫРл∞ЫлКФлЛ§. лЛ§лІМ мД†м†Х мЭінЫДмЧРлКФ нЦЙмВђмЧР лФ∞лЭЉ мµЬлМА 1500лІМмЫРмЭШ м†ХлґА мІАмЫР, мВђлІЭ мЛЬ мЮ•л°А л≥ім°∞лєД, кЄ∞нГА нЩЬлПЩмЧР лФ∞л•Є мІАмЫРкЄИ лУ±мЭШ нШЬнГЭмЭі лНФнХімІДлЛ§. вАШмЭіл¶Дк∞ТвАЩмЧР лФ∞лЭЉ нМФл¶ђлКФ мЮСнТИ к∞Ак≤©к≥Љ мИЂмЮРлПД нБђк≤М лКШмЦілВЬлЛ§. мЮ•мЭЄлУ§мЭі л™©мЭД лІђ л≤ХнХШлЛ§. нХіл≤ХмЭА к∞ДлЛ®нХШлЛ§. вАШл≥ік≥† лШР л≥ік≥†вАЩ нИђл™ЕмД±мЭД нЩХл≥інХШлКФ кЄЄ, кЈЄк≤ГлњРмЭілЛ§.
мШ§мГБлПД кЄ∞мЮР sdoh@seoul.co.kr
2013-11-28 23л©і
Copyright вУТ мДЬмЪЄмЛ†лђЄ All rights reserved. лђілЛ® м†ДмЮђ-мЮђл∞∞нПђ, AI нХЩмКµ л∞П нЩЬмЪ© кЄИмІ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