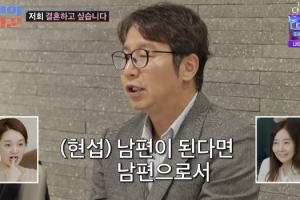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간 뒤 7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디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이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지갑을 닫는다. 기업은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인다. 아무도 생산도 소비도 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디플레이션의 징후는 이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요국 소비자물가 금융위기 수준…유럽은 2년째 악화일로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바닥을 기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블룸버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집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10월 평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3% 오르는데 그쳤다.
남은 2개월 동안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올해 0%의 저(低)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0.1%) 이래 최저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다.
올해 1∼10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역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9%를 찍었다가 이듬해부터 2% 대로 회복했다. 하지만 2013년 들어서 0.8%, 지난해 -0.2%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3월부터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등은 2009년 직후에 나타나던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에 독일 물가는 0.23%, 프랑스는 0.02%, 이탈리아는 0.23%씩 올라 모두 0%대를 기록했다. 영국도 0.02%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 0.5%보다도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화 약세 때문에 (유로존의) 수입품 물가가 올랐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다”며 “(낮은) 물가상승률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 경제 강국들도 고전…한국, 디플레이션은 ‘아직’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은 수차례 물가 하락을 겪으면서 디플레이션과 그 뒤에 연이어 오는 저성장의 여파를 익히 경험해왔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6%, 지난해 2.4%로 반짝 돌아섰다가 올해 다시 주춤하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1∼9월 물가상승률은 0.97%에 그쳤다.
싱가포르 물가는 올해 열 달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0월 평균 물가 상승률은 -0.44%를 보였으며 이는 2009년 0.6%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중국의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42%로 지난해(1.5%)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2%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후에도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와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의 사정도 밝지 않다.
올해 1∼10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62%, 각 금융기관의 올해 전망치 역시 0.6∼0.7%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 수준보다 낮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가장 낮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당장 한국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유가의 영향을 제외하면 한국의 근원물가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내년에는 전 세계 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저유가 효과가 사라지면서 한국의 물가 상승폭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한국이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불황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이 생산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에 들어설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디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이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지갑을 닫는다. 기업은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인다. 아무도 생산도 소비도 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디플레이션의 징후는 이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요국 소비자물가 금융위기 수준…유럽은 2년째 악화일로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바닥을 기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블룸버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집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10월 평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3% 오르는데 그쳤다.
남은 2개월 동안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올해 0%의 저(低)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0.1%) 이래 최저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다.
올해 1∼10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역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9%를 찍었다가 이듬해부터 2% 대로 회복했다. 하지만 2013년 들어서 0.8%, 지난해 -0.2%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3월부터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등은 2009년 직후에 나타나던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에 독일 물가는 0.23%, 프랑스는 0.02%, 이탈리아는 0.23%씩 올라 모두 0%대를 기록했다. 영국도 0.02%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 0.5%보다도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화 약세 때문에 (유로존의) 수입품 물가가 올랐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다”며 “(낮은) 물가상승률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 경제 강국들도 고전…한국, 디플레이션은 ‘아직’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은 수차례 물가 하락을 겪으면서 디플레이션과 그 뒤에 연이어 오는 저성장의 여파를 익히 경험해왔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6%, 지난해 2.4%로 반짝 돌아섰다가 올해 다시 주춤하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1∼9월 물가상승률은 0.97%에 그쳤다.
싱가포르 물가는 올해 열 달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0월 평균 물가 상승률은 -0.44%를 보였으며 이는 2009년 0.6%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중국의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42%로 지난해(1.5%)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2%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후에도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와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의 사정도 밝지 않다.
올해 1∼10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62%, 각 금융기관의 올해 전망치 역시 0.6∼0.7%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 수준보다 낮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가장 낮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당장 한국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유가의 영향을 제외하면 한국의 근원물가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내년에는 전 세계 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저유가 효과가 사라지면서 한국의 물가 상승폭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한국이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불황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이 생산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에 들어설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