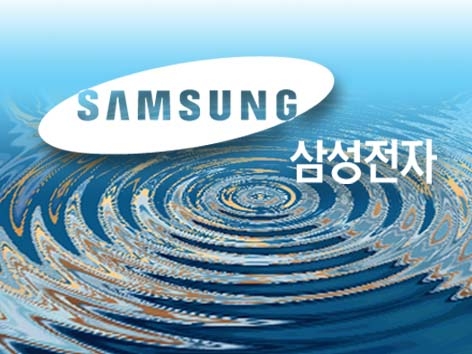
위기라는 단어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경제와 안보 쪽이다. 안보 위기는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성 때문에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반면, 경제 위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사용하는 경제·시사용어일 것이다. 인류는 1930년 세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1987년 블랙먼데이 등 수도 없이 많은 표현들로 경제 위기를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 있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경제 위기일 것이다. ‘위기 경제학´의 저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도 “경제 위기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우연히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돼 온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현재 우리의 경제가 위기 국면에 있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뜨거웠다. 언론과 야당은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위기론을 주장해 온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위기로 표현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다. 열흘 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발언이 반전의 시작이다. 이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여당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위기론을 거듭 거론해 주목된다. 그는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며 사장단에 사실상 비상경영을 주문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체 수장의 ‘위기론’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과도 맥이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위기론에서는 희망도 느껴진다. 선대 회장들이 위기론을 거론할 때마다 엄청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2010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전시장에서 “10년 후 구멍가게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 역시 1983년 3월 “첨단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삼성그룹은 물론 나라의 장래까지 암담해질 것”이라는 위기론을 펼쳤지만, 삼성전자는 지금껏 국가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됐다. 이번 위기론도 삼성전자와 국가경제에 새로운 기회로 작동되길 기대한다.
yidonggu@seoul.co.kr
2019-06-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