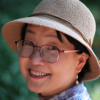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그해 9월 19일 베이징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터져 나온 남북 간 축구 친선경기 성사 소식은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다. 일사천리였다. 불과 열흘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경기 명칭도 ‘남북통일 축구경기’로 발표됐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못 된 10월 11일 과연 남과 북은 축구공을 앞에 두고 어깨동무를 했다.
오후 3시 한 해 전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능라도에 새로 지어진 ‘5월 1일 경기장’에는 15만명의 북녘 동포가 꽉 들어찼다. 북한이 2-1승을 거뒀지만 이기고 지는 건 그리 중요치 않았다. 축구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된 모습을 경기장에서, 혹은 TV로 지켜보던 한반도의 구성원들에게 남북 통일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남측 선수단 고문으로 함께 평양을 방문한 이회택 당시 포항제철 감독은 40년 만에 아버지와 상봉하는 눈물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보다 격한 통일의 메시지가 또 있었을까.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선 그때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선수들이 또 축구공을 앞에 두고 만난다. 주인공은 남북통일 축구경기 당시 실제 경기를 가졌던 남자와는 달리 합동훈련에 그쳤던 여자 선수들이다. 이번에는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본선, 2년 뒤 프랑스에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린 실전이다.
그러나 지금이 1990년 당시와 가장 많이 다른 건 그동안 양측 정권의 헤게모니 변화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듯 상승과 급락을 거듭한 ‘남북 그래프’의 곡선이 최저점에 와 있는 양측의 상황이다. ‘축구는 정치, 인종, 종교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FIFA는 부르짖는다. 하지만 적어도 분단 70년을 넘긴 지금의 우리네 상황에서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
북측의 상황은 접어 두더라도 우리네 스포츠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이 좌지우지했다. 1980년대 초 출범한 프로축구, 프로야구는 태생적으로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요리되고 달디단 설탕까지 뿌려진, 대표적인 ‘달래기 메뉴’였다.
둘은 환골탈태를 외치며 30년 넘은 몸부림 끝에 지금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외 대부분은 늘 권력자 혹은 그 추종자들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되기 일쑤였다. 동계올림픽을 측근의 돈벌이 장소쯤으로 생각한 전 정권의 추악함도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는 신비한 마력이 있다. 특히 남과 북의 경우에는 더하다. 국제 대회장에서 둘이 만나면 이념의 갈등보다는 동족의 전류가 먼저 흐른다. 그라운드에서 함께 나뒹구는 축구에서 둘이 튀기는 불꽃은 밝고 거대하다.
이제 FIFA의 말대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남북 축구를 보고 싶다. 만약 1990년 능라도경기장이 누군가 잘 만든 각본의 무대였다면 27년 만에 같은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남과 북 젊은이들이 펼치는 공차기는 어떠할까.
하루 뒤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cbk91065@seoul.co.kr
2017-04-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