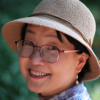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한국농구연맹(KBL) 코트에서 다섯 시즌을 보내며 특별귀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리카르도 라틀리프(28·삼성) 얘기다. 그는 한 팀에서 호흡을 맞추는 마이클 크레익처럼 랩이나 댄스로 좌중을 사로잡을 능력도, 지난 시즌 오리온에서 뛰었던 조 잭슨처럼 당돌한 발언으로 취재진을 들었다 놓았다 하지도 못했다. 2014~15시즌 오리온, 다음 시즌 LG 유니폼을 입었던 트로이 길렌워터와 같은 ‘야수의 얼굴 뒤에 감춰진 소녀 감성’이었다.
그런 라틀리프가 궁지에 몰려 있다. 지난 10일 SK와의 경기 도중 최준용이 부상 위협을 끼쳤다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그의 옆머리를 차례로 찍었다. 일부는 서부극에서 총 방아쇠를 당긴 뒤의 동작을 연상시킨다며 흥분했다. 동영상을 돌려 보면 아주 도리질을 칠 정도는 아니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편집자들에게 기회 있으면 하는 주문이 ‘용병’이란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글자 하나 줄이려고 그들을 ‘돈 받고 다른 나라에 팔려 온’ 존재로 격하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체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기자라도 외국인 선수와 흉허물 없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주고받기란 불가능하다. 언어의 벽만이 아니라 인식과 가치관, 문화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기자가 프로축구와 프로농구를 취재하며 만난 외국인 선수들은 늘 틈입자로서 경계하고 벽을 세웠다. ‘날 돈 보고 팔려온 존재로 보는 것 아닌가’란 방어기제를 갖고 있었다. 통역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간극을 메우는 건 벅찬 일이다.
팬들은 어떤가? 2014~15시즌 ‘애국가 스트레칭’으로 LG에서 퇴출된 데이본 제퍼슨 사례가 단적인 예다. 우리 돈을 받고 뛰는 용병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무시했다고 얼마나 지청구를 퍼부었던가?
이렇게 라틀리프가 곤궁한 처지에 몰린 상황에 과거 귀화 가능성이 언급됐던 애런 헤인즈(오리온)가 지난 14일 삼성전 승부처에서 5반칙 퇴장을 당하자 손가락으로 돈을 세는 동작을 했다. 아홉 시즌째 KBL 코트에서 뛰고 있어 우리 문화와 팬들의 속성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일부 팬들의 편견 속에 자리잡은 ‘돈 받고 뛰는 선수’가 ‘돈 받고 판정한다’는 위험천만한 선입견을 드러낸 것이다.
KBL은 그제 재정위원회를 열어 헤인즈에게 제재금 200만원, 라틀리프와 같은 경기 도중 팔꿈치로 가격한 문태영(삼성)에게 1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어제야 알렸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재금보다 팬들이 ‘물 설고 낯 설은’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자신들을 보듬어 안는 일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 용병이란 표현 속에 갇혀 그들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흘려보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bsnim@seoul.co.kr
2017-01-1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