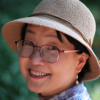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지난 9일에는 미국의 19세 수영 선수 릴리 킹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 여자 평영 100m 금메달을 목에 건 킹은 기자회견 도중 도핑 징계가 풀려 돌아온 선수단의 15년 선배 스프린터 저스틴 게이틀린의 대회 출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킹은 “스포츠끼리, 국가끼리 이런 일들에 얽혀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확실한 원칙을 정립해 이를 종식할 필요가 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내 프로야구 경기가 끝난 뒤 선수 인터뷰를 자주 듣는 편인데 실소를 터뜨릴 때가 많다. 나이는 어리지만 킹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태도와 용기를 배워야 할 것 같다. 킹은 그 전부터 러시아 수영 선수 율리야 에피모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선처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수단 선배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과거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선수들은 출전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CAS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를 이행했다면 올림픽 출전을 막는 건 아니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부끄러운 것은 도핑 관련 식견과 이해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언론, 적어도 기자의 실력 부족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건 건너뛰고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못하고’ 식의 흥미 위주 기사만 쏟아냈다.
더 근본적이고도 넓게는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우리 선수들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데도 우리 언론은 여전히 관성을 좇아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전하려고 열심인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구체적인 통계를 댈 능력은 안 되지만 4년 전 런던올림픽 때보다 매체들이 내놓는 기사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그런데 그건 그저 매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클릭에 목매는 기사 작성이 보편화됐기 때문일 따름이다.
오랜 기간 해당 종목과 선수를 취재한 깊이 있는 기사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눈이나 사로잡고 말겠다는 얄팍함이 넘쳐난다. 그런 얄팍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데도 말이다. 그래서 이 얄팍함의 바다가 싫으면서도 기자 역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살겠다며 조건반사적으로 팔부터 내뻗어 보고 있다.
bsnim@seoul.co.kr
2016-08-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