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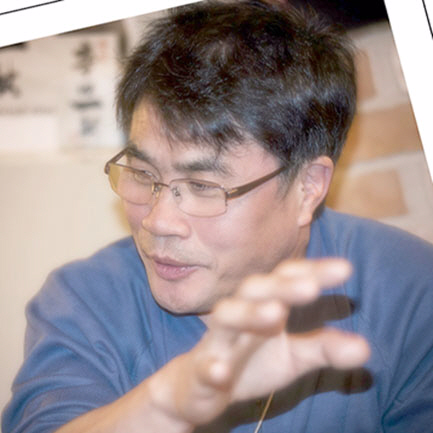
조영학 번역가
겉으로만 번드레한 말, 말은 있으되 말이 아닌 말, 글 쓰는 이들은 이를 교언(巧言)이나 허언(虛言)이라 하여 기피한다. 실체를 드러내는 데 실패한 글이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다르다. 우중을 속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목적인 한 입발림말은 오히려 그들의 본질에 가깝다. 그래서 입만 열면 국민이고 말끝마다 정의이며 “구국을 위한 결단”으로 사리사욕을 포장하고 “균형 있는 수사”로 자기편을 보호한다. 그 바람에 말의 향연을 걷어내고 숨은 진의를 파악하느라 우리 민초들만 피로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TV 뉴스를 보면서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속 터져”였다. 이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건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투정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대선공약이기도 한 세월호 진상규명은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 세월호를 능멸한 인물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공소시효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며 전교조는 8년째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성범죄자들이 판결을 먹고산다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다.
늘 핑계는 있다. “의석수가 과반이 안 돼서.” “야당의 방해가 심해서.” 그래서일까. 이 정부 들어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협치내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의장(문희상)도 국무총리(정세균)도 취임인사에서 제일 먼저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법안 하나 통과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간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어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한다. 듣기 좋은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기에 새 국회에 협치를 주문하는 여론도 70% 가까운 모양이다. 그래서 그간의 정치가 원만했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대 국회에서 제1야당은 16차례나 국회를 보이콧했다. 여기에 단식, 삭발, 장외투쟁 등을 더하면 ‘협치’는 말 그대로 말뿐인 말로 전락하고 만다. 여당은 정말로 협치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보수야당의 횡포를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교언을 미루기 위한 또 하나의 교언이었던 걸까.
한국 정치사에서 여야의 협치는 늘 거짓말이자 입발림말이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은 3당 합당을 주도하며 ‘구국의 대타협’을 내걸었다. 그후 민주주의는 30년이나 역주행하고 ‘살인마 전두환·노태우’를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지지율이 폭락했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60%가 넘었건만 노 정부는 야당과 원로의 의견을 듣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2007년 사학법 개악을 거쳐 교육현장은 오늘도 시궁창에서 허덕거린다.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도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또다시 협치를 끌어들인다.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적과의 동침’에서 로라는 마침내 남편과의 결별에 성공한다. 그 후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모친의 말이 인상적이다. “You have yourself.” 대충 번역하자면 “너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도 180석의 여당을 향해 그렇게 말해 주고 싶다. 꼭 협치를 해야겠니? 이제 너 혼자서도 해낼 수 있잖아. 지지자들 속 터지는 꼴을 또 봐야겠니?
2020-05-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