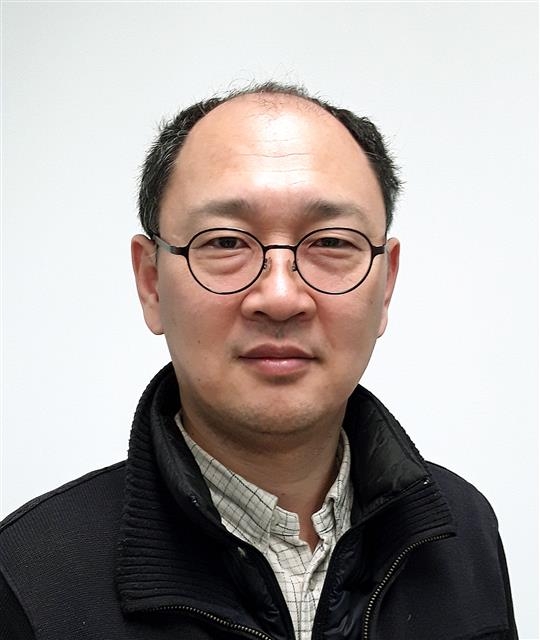
조현석 사회부장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한 문학평론가에게 겨우 빌려서 읽은 소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40페이지 분량의 길지 않은 소설 속엔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른 원로 시인의 과거 행적이라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설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소설 속 화자가 ‘악령’이라고 지칭한 승려 출신의 한 시인을 수십년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내용이다. 단지 소설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고은 시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소설에 따르면 ‘누더기 승복에 짚신을 신은’ 이 시인은 이른바 ‘명사(名士) 사냥’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높여 가고, 서른 가까이 등단해서 봇물이 터진 듯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는 여성을 건드리고 다니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순수 문학계에서 외면받자 자신을 진보 문학인으로 포장을 한다. 가나다순으로 적는 시국 선언 등의 명단 첫 머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악이 번성하는 파렴치한 엽색의 식단도 풍성했다. 자랑스레 휘젓고 다니는 색주가는 기본이었고, 손쉽게 뒷말이 없는 유부녀는 속되게 표현해 간식이었다’고 폭로했다. 최영미 시인이 ‘괴물’을 통해 ‘En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했던 것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물론 소설 속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 문단 내 성추행 문제를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단은 침묵했고, 추악한 행동은 이어졌다. 모두가 공범이었거나 최소한 방관자였던 셈이다.
지난 1월 29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 검사는 2010년 한 상가(喪家)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추행당했다. 그 자리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서 검사 폭로 전에 임은정 검사 등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외면을 당했다.
지난주 본사가 진행한 미투 좌담회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요즘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제서야 귀를 기울였을 뿐 성폭력 문제는 오래전부터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이 지난 27년간 상담한 건수가 8만 200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 피해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귀를 닫고, 가슴을 닫았던 것이다.
유명인 중심으로 이어지던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다. 미투 운동이 더 확산되려면 강력한 처벌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방관자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마땅히 곁에서 도와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문제가 단지 한 개인만을 ‘괴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성평등과 차별 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에도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후세로부터 또다시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hyun68@seoul.co.kr
2018-03-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