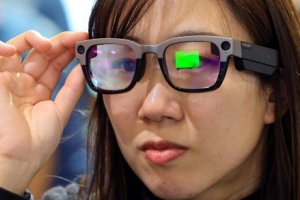최여경 국제부 차장
며칠 전 만난 지인이 말했다. 그의 이름은 1년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거론됐다. 급기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당시 언론은 그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겸임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둥, ‘비선실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둥. 나중에야 밝혀진 진실을 언론은 외면했다. 기사만으로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됐고, 그의 부인과 어린 아들은 상처를 받았다. 여전히 괴로운 기억을 남긴 1년 전 그때를 두고 그는 한참이나 하소연했다.
언론의 속보 경쟁에선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다. 빨리 기사를 제공해 기사 클릭수를 올려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그런 것따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중랑 여중생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살해범의 성적 문제부터 엽기적인 행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가족에 대한 짐작이 가득한 선정적인 기사들이 뿌려졌다.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살해범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연관 검색어에는 ‘성불구’와 ‘문신’이 자리했다. 매체에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심지어 ‘단독’을 붙여 미성년 피해자가 당한 일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망자와 유족에 대한 배려는 느낄 수 없었다.
9년 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이 떠올랐다. 2008년 12월 어느 날 8살 여자아이를 강간·상해한 사건이다.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 방식은 물론 피해 아동의 상태를 매일매일 중계하며 보도 경쟁을 벌였다. 어느 날 기사를 확인하다가 언론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솟구친 기억이 있다. 모든 매체가 피해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제목을 뽑았다. 그중 이런 제목도 있었다. ‘○○이 임신 OK’.
이런 보도 행태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긴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언론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를 이어 갔다. 흉악 범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인권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썩 달라지지 않았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사를 쓰고, 포털은 독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기사를 배달하는 세상이 왔는데, 언론은 늘 가던 길을 걷는 모습이다. 세상의 변화와 아예 다른 길로 가면서 잰 보폭으로 열심히 발만 놀린다.
사회부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로 사건 기사라 매일매일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지, 혹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입힐 우려는 없는지. 이런 고민은 때론 회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인터넷 사이트 트래픽 수치와 다른 매체의 시선끌기용 기사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깊은 고민이 허망하게 져 버릴 때도 있다.
기사가 쏟아지는 요즘 언론 소비자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언론 활용법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절실하다. 우리의 독자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꼼꼼히 알려 주는 폭넓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다른 매체를 모델이나 경쟁자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다른 매체의 기사를 따라 쓰고, 제목을 흉내 내는 식은 안 된다. 어떤 기사로 독자의 마음을 살 것인가, 매일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한다.
cyk@seoul.co.kr
2017-11-0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