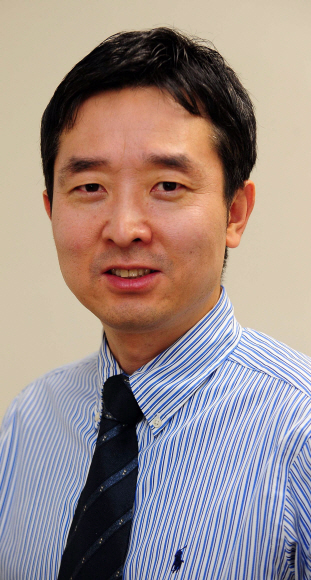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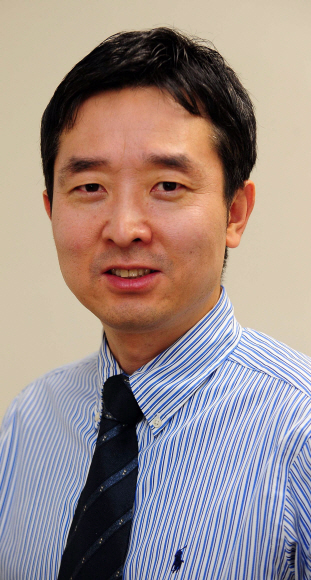
이도운 논설위원
가장 최근에 인터뷰한 인물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그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접 뛰어들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나는 ‘할 것 같다.’고 답변하고 싶다.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1시간 50분간의 인터뷰를 끝내고 문 이사장에게 확인 질문을 했다. “오늘 출마 여부와 관련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 가운데 ‘아직은 결정할 시기가 아니고, 선거 때가 다가오면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을 기사로 쓰겠다. 그러면 편집에서는 ‘출마 가능성 배제 안해’라고 제목을 뽑을 것이다. 그래도 되겠느냐?” 문 이사장은 빙긋이 웃으며 “그렇게 하십쇼.”라고 말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인터뷰는 ‘의외로’ 지난 1월 14일 가졌던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대담이었다. 사흘 뒤 지면에 실린 김 지사 인터뷰 기사는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에서 그날 ‘가장 많이 본 정치기사’가 됐다. 대중이, 혹은 네티즌들이 김 지사에게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료 언론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의 인터뷰였다. 인터뷰 날짜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기 바로 전날인 지난 1월 26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 속에 이 지사의 착잡함, 비장함, 허탈함, 마지막 희망, 이런 감정들이 묻어났다. 그런 감정 속에서도 이 지사는 2012년을 넘어 2017년까지 바라보고 답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는 ‘터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손 대표는 질문·답변이든 사진 촬영이든 ‘인위적인’ 연출을 원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또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듯한 질문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격을 했다. “당의 실세는 손 대표가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라는 말들도 나온다.”고 당내 사정을 꼬집어 보자 “무슨 여의도 참새들이나 지저귀는 듯한 질문을 던지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여당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는 재미가 덜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야당 정치인들보다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반향이 가장 컸던 것은 이재오 특임장관과의 인터뷰였다. 지난해 10월 23일, 정권 실세로 돌아온 이 장관은 당시 검찰의 기업 수사가 “구여권에 대한 수사”라고 규정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많은 언론이 사설과 논평으로 다뤘을 정도였다. 이 장관에게 “매일 지하철로 출근하고, 5000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는데, 그러러면 무엇하러 실세를 하느냐.”고 던져봤다. 이 장관은 “바로 그런 것이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반격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을 세 차례 하고 도지사를 연임했지만 말과 행동은 여전히 서민 같았다. 김 지사에게 “주변에 아직도 민중당 출신이 많다. 이들도 김 지사처럼 모두 전향했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김 지사가 아니라 배석했던 민중당 출신 최우영 대변인이 자청했다. “의(義)를 버리고 이(利)를 택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김 지사와 함께한 지가 10여년이다. 우리도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너 바뀌었느냐’고 계속 물으면 좀 그렇다.”
독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는 아직 인터뷰할 기회가 없었다. 박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하지 않았다.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감정은 안도감과 아쉬움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요 시·도지사 등을 대부분 인터뷰했지만 그 가운데 ‘엉터리’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없었다. 거기서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열정을 느끼게 해준 인물도 거의 없었다. 나의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거기서 아쉬움을 느낀다.
dawn@seoul.co.kr
2011-07-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