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ұҙ축계к°Җ мӢңлҒ„лҹҪлӢӨ. м„ёмў…мӢң мӢ мІӯмӮ¬ көӯм ңм„Өкі„кіөлӘЁм—җм„ң м Ҳм°ЁмғҒмқҳ л¬ём ңк°Җ мһҲм—Ҳкі к·ё кІ°кіј м„ёмў…мӢңмқҳ кё°ліё к°ңл…җм—җ л§һм§Җ м•ҠмқҖ м•Ҳмқҙ лӢ№м„ лҗҳм—Ҳ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мӢ¬мӮ¬мң„мӣҗмһҘкіј мқјл¶Җ мӢ¬мӮ¬мң„мӣҗмқҙ мӮ¬нҮҙн•ҳлҠ” мҙҲмң мқҳ мӮ¬нғңк°Җ лІҢм–ҙмЎҢлӢӨ. м§ҖкёҲ м—¬кё°м—җ лҢҖн•ҙ мҳЁк°– мқҳкІ¬мқҙ мҳӨк°ҖлҠ” мӨ‘мқҙлӢӨ. м–ҙл””м„ңл¶Җн„° мһҳлӘ»лҗҳм—ҲлҠ”к°Җ? л¬ҙм—Үмқҙ кіөм •н•ң м Ҳм°Ёмқёк°Җ? л¬јлЎ лӢӨлҘё 분야м—җм„ңлҸ„ 비мҠ·н•ң л…јлһҖмқҙ мў…мў… мқјм–ҙлӮңлӢӨ. мқҙлІҲм—җлҠ” к·ё л¬ём ңк°Җ кұҙ축мқ„ нҶөн•ҙ л“ңлҹ¬лӮ¬мқ„ лҝҗмқҙлӢӨ. к·ёлҹ°лҚ° мқҙкІғмқҙ мғҲмӮјмҠӨлҹҪкІҢ л…јмқҳлҘј н•ҙм•ј н•ҳлҠ” л¬ём ңмқјк№Ң? мҡ°лҰ¬лҠ” м •л§җ мқҙ м§Ҳл¬ём—җ лҢҖн•ң лӢөмқ„ лӘЁлҘҙлҠ” кІғмқјк№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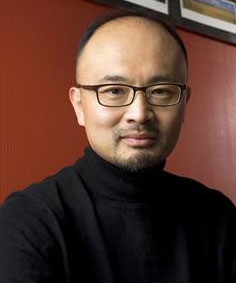
нҷ©л‘җ진 кұҙ축к°Җ
![нҷ©л‘җ진 кұҙ축к°Җ]() к·ёл Үм§Җ м•ҠлӢӨ. мқҙлҜё мқёлҘҳк°Җ мҳӨлһ«лҸҷм•Ҳ н•Ёк»ҳ кі лҜјн•ҙ мҳЁ л¬ём ңлӢӨ. мқёлҘҳмқҳ кұҙ축мқҖ мӨ‘мҡ”н•ң м„Өкі„кіөлӘЁлҘј кі„кё°лЎң 비м•Ҫм Ғмқё л°ңм „мқ„ н•ҙмҳ¬ мҲҳ мһҲм—ҲлӢӨ. лҘҙл„ӨмғҒмҠӨмқҳ мғҒ징мқё н”јл ҢмІҙ лҢҖм„ұлӢ№мқҳ лҸ”мқҖ л¬јлЎ , 20м„ёкё° кұҙ축계м—җ мқјлҢҖ 충격мқ„ мӨҖ н”„лһ‘мҠӨмқҳ нҗҒн”јл‘җм„јн„° л“ұмқҙ лӘЁл‘җ м„Өкі„кіөлӘЁлҘј кұ°міӨлӢӨ. мқҙл ҮкІҢ лҲ„м Ғлҗң м§ҖнҳңлҘј лӘЁм•„ м Ҳм°Ём—җ лҢҖн•ң лӢөлҸ„ л§Ңл“Өм–ҙ л‘җм—ҲлӢӨ. мҰү м„Өкі„кіөлӘЁмқҳ кіөм •м„ұмқ„ мң„н•ң көӯм ң н‘ңмӨҖмқҖ мқҙлҜё мЎҙмһ¬н•ңлӢӨ. к·ёмӨ‘ к°ҖмһҘ лҢҖн‘ңм Ғмқё мӮ¬лЎҖлқјкі н• мҲҳ мһҲлҠ” кІғмқҙ мң м—”мқҙ мқём •н•ҳлҠ” мң мқјн•ң көӯм ңм Ғ кұҙ축 лӢЁмІҙмқё мң м•„мқҙм—җмқҙ(UIA)мқҳ вҖҳкөӯм ңм„Өкі„кіөлӘЁ м§Җм№ЁвҖҷмқҙлӢӨ.
к·ёл Үм§Җ м•ҠлӢӨ. мқҙлҜё мқёлҘҳк°Җ мҳӨлһ«лҸҷм•Ҳ н•Ёк»ҳ кі лҜјн•ҙ мҳЁ л¬ём ңлӢӨ. мқёлҘҳмқҳ кұҙ축мқҖ мӨ‘мҡ”н•ң м„Өкі„кіөлӘЁлҘј кі„кё°лЎң 비м•Ҫм Ғмқё л°ңм „мқ„ н•ҙмҳ¬ мҲҳ мһҲм—ҲлӢӨ. лҘҙл„ӨмғҒмҠӨмқҳ мғҒ징мқё н”јл ҢмІҙ лҢҖм„ұлӢ№мқҳ лҸ”мқҖ л¬јлЎ , 20м„ёкё° кұҙ축계м—җ мқјлҢҖ 충격мқ„ мӨҖ н”„лһ‘мҠӨмқҳ нҗҒн”јл‘җм„јн„° л“ұмқҙ лӘЁл‘җ м„Өкі„кіөлӘЁлҘј кұ°міӨлӢӨ. мқҙл ҮкІҢ лҲ„м Ғлҗң м§ҖнҳңлҘј лӘЁм•„ м Ҳм°Ём—җ лҢҖн•ң лӢөлҸ„ л§Ңл“Өм–ҙ л‘җм—ҲлӢӨ. мҰү м„Өкі„кіөлӘЁмқҳ кіөм •м„ұмқ„ мң„н•ң көӯм ң н‘ңмӨҖмқҖ мқҙлҜё мЎҙмһ¬н•ңлӢӨ. к·ёмӨ‘ к°ҖмһҘ лҢҖн‘ңм Ғмқё мӮ¬лЎҖлқјкі н• мҲҳ мһҲлҠ” кІғмқҙ мң м—”мқҙ мқём •н•ҳлҠ” мң мқјн•ң көӯм ңм Ғ кұҙ축 лӢЁмІҙмқё мң м•„мқҙм—җмқҙ(UIA)мқҳ вҖҳкөӯм ңм„Өкі„кіөлӘЁ м§Җм№ЁвҖҷмқҙлӢӨ.
н•өмӢ¬м Ғмқё кІғл§Ң 추л Өліҙл©ҙ лӢӨмқҢкіј к°ҷлӢӨ. м ң7н•ӯм—җ мқҳн•ҳл©ҙ м°ёк°Җмһҗл“ӨмқҖ мҳӨм§Ғ мқөлӘ…мңјлЎңл§Ң м°ём—¬н•ҳкі мӢ¬мӮ¬л°ӣлҠ”лӢӨ. л”°лқјм„ң м°ёк°Җмһҗмқҳ мӢ мғҒмқҙ мӢ¬мӮ¬мң„мӣҗм—җкІҢ кіөк°ңлҗҳлҠ” к·ё м–ҙл–Ө мў…лҘҳмқҳ м ‘мҙүлҸ„ к·ңм • мң„л°ҳмқҙлӢӨ. м ң21н•ӯмқҖ вҖҳмЈјмөңмһҗлҠ” мӢ¬мӮ¬мң„мӣҗмқҳ кІ°кіјм—җ мҠ№ліөн•ҙм•ј н•ңлӢӨвҖҷкі лӘ…мӢңн•ҳкі мһҲлӢӨ. мҰү UIAмқҳ мҠ№мқён•ҳм—җ 진н–үлҗң м„Өкі„кіөлӘЁмқҳ кІ°кіјм—җлҠ” к°•м ңм„ұмқҙ мһҲлӢӨ. м ң29н•ӯмқҖ м Җмһ‘к¶Ңм—җ лҢҖн•ң кІғмқҙлӢӨ. м„Өкі„мһҗлҠ” мһ‘н’Ҳм—җ лҢҖн•ң м Җмһ‘к¶Ңмқ„ к°Җм§Җл©° л°ңмЈјмІҳлҠ” мһ„мқҳлЎң лӢ№м„ мһ‘мқҳ лӮҙмҡ©мқ„ ліҖкІҪн• мҲҳ м—ҶлӢӨкі лҗҳм–ҙ мһҲлӢӨ. м ң33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мқҙ мӮ¬м „м—җ кө¬м„ұлҗҳкі к·ё мқҙлҰ„мқҙ м§Җм№Ём„ңм—җ лӘ…кё°лҗҳм–ҙм•ј н•Ёмқҙ, м ң35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мқҳ кіјл°ҳмҲҳк°Җ мҷёкөӯмқёмқҙм–ҙм•ј н•Ёмқҙ, м ң36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 мӨ‘ мөңмҶҢ н•ң лӘ…мқ„ UIAк°Җ м§ҖлӘ…н•ҙм•ј н•Ёмқҙ, м ң38н•ӯм—җм„ңлҠ” UIAлҢҖн‘ңлҠ” м ңл°ҳ к·ңм •мқҙ мӨҖмҲҳлҗҳм§Җ м•Ҡмңјл©ҙ мІ мҲҳн•ҙм•ј н•Ёмқҙ, к·ёлҰ¬кі м ң41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мқҖ м„Өкі„кІҪкё° л°Ҹ мқҙмқҳ 추진мқ„ мң„н•ң м–ҙл– н•ң мң„мӣҗнҡҢм—җлҸ„ м§Ғк°„м ‘м ҒмңјлЎң м°ём—¬н• мҲҳ м—ҶмқҢмқҙ лӘ…кё°лҗҳм–ҙ мһҲлӢӨ.
л°ңмЈјн•ҳлҠ” мёЎ мһ…мһҘм—җм„ң ліҙл©ҙ к·ём•јл§җлЎң мһҗкё°мқҳ мҶҗкіј л°ңмқ„ лӢӨ 묶м–ҙ лІ„лҰ¬лҠ” м§Җм№ЁмқҙлӢӨ. к·ёл ҮлӢӨл©ҙ мҷң мқҙлҘј к°җмҲҳн•ҳлҠ” кІғмқјк№Ң? к·ёлһҳм•ј кіөм •м„ұмқҙ нҷ•ліҙлҗҳкё° л•Ңл¬ёмқҙкі көӯлӮҙмҷёмқҳ лӣ°м–ҙлӮң кұҙ축к°Җл“Өмқҙ м°ём—¬н• кІғмқҙкё° л•Ңл¬ёмқҙлӢӨ. м—„мІӯлӮң н—ҢмӢ мқҙ н•„мҡ”н•ң м„Өкі„кіөлӘЁм—җм„ң к·ё кіөм •м„ұмқҙ мқҳмӢ¬ л°ӣмңјл©ҙ нӣҢлҘӯн•ң мқёмһ¬л“Өмқҳ м°ём—¬лҘј кё°лҢҖн•ҳкё° м–ҙл өлӢӨлҠ” кІғмқ„ кІҪн—ҳмңјлЎң к№ЁлӢ¬мқҖ кІғмқҙлӢӨ. мҰү кё°н•„мҪ” мўӢмқҖ кІ°кіјлҘј л§Ңл“Өм–ҙ лӮҙкІ лӢӨлҠ” мЈјмөң мёЎмқҳ нҲ¬мІ н•ң мҶҢлӘ…мқҳмӢқмқҙ мһҲмқ„ л•Ң, к·ёл“ӨмқҖ кё°кәјмқҙ мҠӨмҠӨлЎңмқҳ мҶҗл°ңмқ„ л¬¶кі к·ё м Ҳм°ЁлҘј м ң3мһҗм—җкІҢ мң„мһ„н• кІғмқҙлӢӨ.
мқҙлҘј 3к¶Ң 분лҰҪмқҳ м •мӢ мңјлЎң мқҙн•ҙн• мҲҳлҸ„ мһҲлӢӨ. м§Җм№Ём„ңлҠ” мһ…лІ•мқҙлӢӨ. лӘ…징н•ң м–ём–ҙлЎң к·ё нҳ„мғҒкіөлӘЁк°Җ 추кө¬н•ҳлҠ” к°Җм№ҳлҘј лӢҙм•„ лӮҙм•ј н•ңлӢӨ. м—ҙлҰ° м•„мқҙл””м–ҙк°Җ н•„мҡ”н•ң л¶Җ분м—җ лҢҖн•ҙм„ңлҸ„ к·ё м–ём–ҙ мһҗмІҙлҠ” лӘ…нҷ•н•ҙм•ј н•ңлӢӨ. м°ёк°ҖмһҗлҠ” к·ё м§Җм№Ём„ңмқҳ лӮҙмҡ©м—җ ліёмқёмқҳ н•ҙм„қмқ„ лҚ”н•ҳм—¬ кі„нҡҚм•Ҳмқ„ л§Ңл“ лӢӨ. мӢ¬мӮ¬мң„мӣҗ м—ӯмӢң нҢҗлӢЁмқҳ кё°мӨҖмқҖ м§Җм№Ём„ңлӢӨ. к·ёлҹ°лҚ° л§Ңм•Ҫ м§Җм№Ём„ңлҘј л§Ңл“ңлҠ” лҚ° кҙҖм—¬н–ҲлҚҳ мӮ¬лһҢл“Өмқҙ мӢ¬мӮ¬лҘј н•ҳкІҢ лҗҳл©ҙ к·ё м••лҸ„м Ғ к¶Ңмң„лЎң лӢӨлҘё мӢ¬мӮ¬мң„мӣҗл“Өмқҳ л…јмқҳлҘј л¬ҙл Ҙн•ҳкІҢ л§Ңл“Ө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 비мң н•ҳмһҗл©ҙ мһ…лІ•кіј мӮ¬лІ•мқҙ 분лҰ¬лҗҳм–ҙм•ј н•ҳлҠ” мқҙм№ҳмҷҖлҸ„ к°ҷлӢӨ.
көімқҙ UIAмқҳ мқҙлҰ„мқ„ л№ҢлҰ¬м§Җ м•ҠлҚ”лқјлҸ„ мқҙлҹ° м •мӢ мқ„ мһҳ мқҙн•ҙн•ҳкі м„Өкі„кіөлӘЁлҘј 진н–үн•ңлӢӨл©ҙ, м Ҳм°Ёмқҳ кіөм •м„ұм—җ лҢҖн•ң кі лҜјмқ„ м ‘м–ҙл‘җкі мҳӨм§Ғ кІ°кіјл¬јмқҳ м§Ҳм—җ лҢҖн•ҙм„ңл§Ң 집мӨ‘н• мҲҳ мһҲлҠ” 분мң„кё°к°Җ л§Ңл“Өм–ҙм§Ҳ кІғмқҙлӢӨ. м—ӯмңјлЎң мқҙлҹ¬н•ң көӯм ң н‘ңмӨҖкіј к·ё м •мӢ мқ„ көімқҙ м§ҖнӮӨм§Җ м•Ҡмңјл Ө н•ҳлҠ” мқҙл“Өмқҙ мһҲлӢӨл©ҙ л°”лЎң к·ёл“Өмқҙ кіөкіөмқҳ м ҒмқҙлӢӨ. м•һмңјлЎңлҸ„ л‘җкі ліј мқјмқҙлӢ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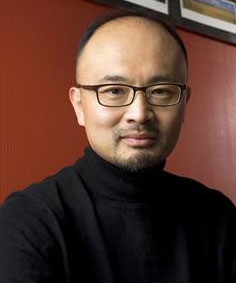
нҷ©л‘җ진 кұҙ축к°Җ
н•өмӢ¬м Ғмқё кІғл§Ң 추л Өліҙл©ҙ лӢӨмқҢкіј к°ҷлӢӨ. м ң7н•ӯм—җ мқҳн•ҳл©ҙ м°ёк°Җмһҗл“ӨмқҖ мҳӨм§Ғ мқөлӘ…мңјлЎңл§Ң м°ём—¬н•ҳкі мӢ¬мӮ¬л°ӣлҠ”лӢӨ. л”°лқјм„ң м°ёк°Җмһҗмқҳ мӢ мғҒмқҙ мӢ¬мӮ¬мң„мӣҗм—җкІҢ кіөк°ңлҗҳлҠ” к·ё м–ҙл–Ө мў…лҘҳмқҳ м ‘мҙүлҸ„ к·ңм • мң„л°ҳмқҙлӢӨ. м ң21н•ӯмқҖ вҖҳмЈјмөңмһҗлҠ” мӢ¬мӮ¬мң„мӣҗмқҳ кІ°кіјм—җ мҠ№ліөн•ҙм•ј н•ңлӢӨвҖҷкі лӘ…мӢңн•ҳкі мһҲлӢӨ. мҰү UIAмқҳ мҠ№мқён•ҳм—җ 진н–үлҗң м„Өкі„кіөлӘЁмқҳ кІ°кіјм—җлҠ” к°•м ңм„ұмқҙ мһҲлӢӨ. м ң29н•ӯмқҖ м Җмһ‘к¶Ңм—җ лҢҖн•ң кІғмқҙлӢӨ. м„Өкі„мһҗлҠ” мһ‘н’Ҳм—җ лҢҖн•ң м Җмһ‘к¶Ңмқ„ к°Җм§Җл©° л°ңмЈјмІҳлҠ” мһ„мқҳлЎң лӢ№м„ мһ‘мқҳ лӮҙмҡ©мқ„ ліҖкІҪн• мҲҳ м—ҶлӢӨкі лҗҳм–ҙ мһҲлӢӨ. м ң33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мқҙ мӮ¬м „м—җ кө¬м„ұлҗҳкі к·ё мқҙлҰ„мқҙ м§Җм№Ём„ңм—җ лӘ…кё°лҗҳм–ҙм•ј н•Ёмқҙ, м ң35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мқҳ кіјл°ҳмҲҳк°Җ мҷёкөӯмқёмқҙм–ҙм•ј н•Ёмқҙ, м ң36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 мӨ‘ мөңмҶҢ н•ң лӘ…мқ„ UIAк°Җ м§ҖлӘ…н•ҙм•ј н•Ёмқҙ, м ң38н•ӯм—җм„ңлҠ” UIAлҢҖн‘ңлҠ” м ңл°ҳ к·ңм •мқҙ мӨҖмҲҳлҗҳм§Җ м•Ҡмңјл©ҙ мІ мҲҳн•ҙм•ј н•Ёмқҙ, к·ёлҰ¬кі м ң41н•ӯм—җм„ңлҠ” мӢ¬мӮ¬мң„мӣҗмқҖ м„Өкі„кІҪкё° л°Ҹ мқҙмқҳ 추진мқ„ мң„н•ң м–ҙл– н•ң мң„мӣҗнҡҢм—җлҸ„ м§Ғк°„м ‘м ҒмңјлЎң м°ём—¬н• мҲҳ м—ҶмқҢмқҙ лӘ…кё°лҗҳм–ҙ мһҲлӢӨ.
л°ңмЈјн•ҳлҠ” мёЎ мһ…мһҘм—җм„ң ліҙл©ҙ к·ём•јл§җлЎң мһҗкё°мқҳ мҶҗкіј л°ңмқ„ лӢӨ 묶м–ҙ лІ„лҰ¬лҠ” м§Җм№ЁмқҙлӢӨ. к·ёл ҮлӢӨл©ҙ мҷң мқҙлҘј к°җмҲҳн•ҳлҠ” кІғмқјк№Ң? к·ёлһҳм•ј кіөм •м„ұмқҙ нҷ•ліҙлҗҳкё° л•Ңл¬ёмқҙкі көӯлӮҙмҷёмқҳ лӣ°м–ҙлӮң кұҙ축к°Җл“Өмқҙ м°ём—¬н• кІғмқҙкё° л•Ңл¬ёмқҙлӢӨ. м—„мІӯлӮң н—ҢмӢ мқҙ н•„мҡ”н•ң м„Өкі„кіөлӘЁм—җм„ң к·ё кіөм •м„ұмқҙ мқҳмӢ¬ л°ӣмңјл©ҙ нӣҢлҘӯн•ң мқёмһ¬л“Өмқҳ м°ём—¬лҘј кё°лҢҖн•ҳкё° м–ҙл өлӢӨлҠ” кІғмқ„ кІҪн—ҳмңјлЎң к№ЁлӢ¬мқҖ кІғмқҙлӢӨ. мҰү кё°н•„мҪ” мўӢмқҖ кІ°кіјлҘј л§Ңл“Өм–ҙ лӮҙкІ лӢӨлҠ” мЈјмөң мёЎмқҳ нҲ¬мІ н•ң мҶҢлӘ…мқҳмӢқмқҙ мһҲмқ„ л•Ң, к·ёл“ӨмқҖ кё°кәјмқҙ мҠӨмҠӨлЎңмқҳ мҶҗл°ңмқ„ л¬¶кі к·ё м Ҳм°ЁлҘј м ң3мһҗм—җкІҢ мң„мһ„н• кІғмқҙлӢӨ.
мқҙлҘј 3к¶Ң 분лҰҪмқҳ м •мӢ мңјлЎң мқҙн•ҙн• мҲҳлҸ„ мһҲлӢӨ. м§Җм№Ём„ңлҠ” мһ…лІ•мқҙлӢӨ. лӘ…징н•ң м–ём–ҙлЎң к·ё нҳ„мғҒкіөлӘЁк°Җ 추кө¬н•ҳлҠ” к°Җм№ҳлҘј лӢҙм•„ лӮҙм•ј н•ңлӢӨ. м—ҙлҰ° м•„мқҙл””м–ҙк°Җ н•„мҡ”н•ң л¶Җ분м—җ лҢҖн•ҙм„ңлҸ„ к·ё м–ём–ҙ мһҗмІҙлҠ” лӘ…нҷ•н•ҙм•ј н•ңлӢӨ. м°ёк°ҖмһҗлҠ” к·ё м§Җм№Ём„ңмқҳ лӮҙмҡ©м—җ ліёмқёмқҳ н•ҙм„қмқ„ лҚ”н•ҳм—¬ кі„нҡҚм•Ҳмқ„ л§Ңл“ лӢӨ. мӢ¬мӮ¬мң„мӣҗ м—ӯмӢң нҢҗлӢЁмқҳ кё°мӨҖмқҖ м§Җм№Ём„ңлӢӨ. к·ёлҹ°лҚ° л§Ңм•Ҫ м§Җм№Ём„ңлҘј л§Ңл“ңлҠ” лҚ° кҙҖм—¬н–ҲлҚҳ мӮ¬лһҢл“Өмқҙ мӢ¬мӮ¬лҘј н•ҳкІҢ лҗҳл©ҙ к·ё м••лҸ„м Ғ к¶Ңмң„лЎң лӢӨлҘё мӢ¬мӮ¬мң„мӣҗл“Өмқҳ л…јмқҳлҘј л¬ҙл Ҙн•ҳкІҢ л§Ңл“Ө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 비мң н•ҳмһҗл©ҙ мһ…лІ•кіј мӮ¬лІ•мқҙ 분лҰ¬лҗҳм–ҙм•ј н•ҳлҠ” мқҙм№ҳмҷҖлҸ„ к°ҷлӢӨ.
көімқҙ UIAмқҳ мқҙлҰ„мқ„ л№ҢлҰ¬м§Җ м•ҠлҚ”лқјлҸ„ мқҙлҹ° м •мӢ мқ„ мһҳ мқҙн•ҙн•ҳкі м„Өкі„кіөлӘЁлҘј 진н–үн•ңлӢӨл©ҙ, м Ҳм°Ёмқҳ кіөм •м„ұм—җ лҢҖн•ң кі лҜјмқ„ м ‘м–ҙл‘җкі мҳӨм§Ғ кІ°кіјл¬јмқҳ м§Ҳм—җ лҢҖн•ҙм„ңл§Ң 집мӨ‘н• мҲҳ мһҲлҠ” 분мң„кё°к°Җ л§Ңл“Өм–ҙм§Ҳ кІғмқҙлӢӨ. м—ӯмңјлЎң мқҙлҹ¬н•ң көӯм ң н‘ңмӨҖкіј к·ё м •мӢ мқ„ көімқҙ м§ҖнӮӨм§Җ м•Ҡмңјл Ө н•ҳлҠ” мқҙл“Өмқҙ мһҲлӢӨл©ҙ л°”лЎң к·ёл“Өмқҙ кіөкіөмқҳ м ҒмқҙлӢӨ. м•һмңјлЎңлҸ„ л‘җкі ліј мқјмқҙлӢӨ.
2018-11-09 29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



![thumbnail - мң л¶ҖлӮЁкіј л¶ҲлҘң мӨ‘ м•„лӮҙ л“ұмһҘвҖҰ10мёө лӮңк°„м—җ л§ӨлӢ¬лҰ° мғҒк°„л…Җ [нҸ¬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