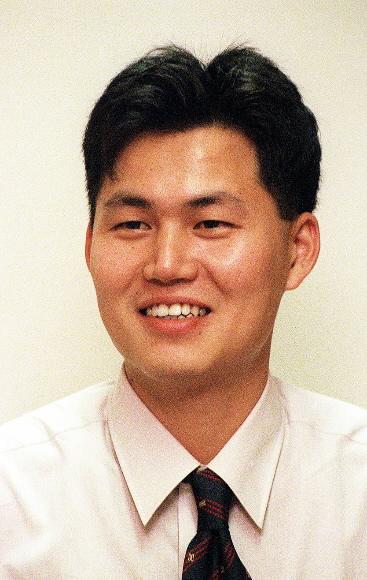
이지운 정치부 차장
구체적인 논거가 있다기보다는 ‘감(感)이 그렇다’고들 한다. 국회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이들이다. 언제라도 여야가 합의 문서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늘 남아있는 곳이 국회이다. 이들의 비관을 뒤따라가 보면 ‘정치권이 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는 인식과 만나게 된다.
여든 야든 지금 핵심 전략은 ‘압박’인 듯 보인다. 다른 정치행위는 못 보여준 지 오래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나 ‘언제까지 가나 보자’는 압박이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가 각각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중점 법안을 수십 개씩 제시했는데, 현재로서는 도대체 통과하기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살벌하기 그지 없는 여야 간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하늘땅 만큼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는 별로 긴장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믿는 구석이 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계속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언젠가 뭔가 내놓을 것이고 그것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얘기다. 이른바 ‘패키지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니 반갑긴 한데, 뭘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아 조정이 가능한 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하겠다고 내놓은 것을 다른 한쪽에서는 결사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릴 엄두도 못 낸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게다. 여야가 지레 겁을 먹은 데에는 특정 정책을 한쪽에서는 선(善), 다른 쪽에서는 악(惡)에 가깝게 규정해 놓은 탓이 크다. 그리고는 서로 열심히 각자의 선전전을 해댄지라 뒤늦게 악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일각에서는 ‘현안을 상임위에 올려 논의부터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같다고도 말한다. 차라리 빅딜로 거래한 뒤 우르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
파행보다는 빅딜 거래가 좋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정치 행위’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러나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도 보고 싶다. 어느 당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양보했는지도 알기 원한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도 드러날 수 있어서다. 이제는 ‘날치기’나 법안의 ‘육탄’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한 반대 끝에 책임을 다른 쪽에 왕창 떠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느 법이 어떤 거래 끝에 어떻게 통과됐는지 의원도, 당도 모른 채 몇 년이 지나 정권이 바뀌고 “너희들도 그때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공방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
jj@seoul.co.kr
2013-11-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