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Voice’ 대표 무하마드
“원조는 결국 비즈니스다.”지난 6월 11일 방글라데시 다카 사무실에서 만난 아흐메드 쇼판 무하마드 보이스(Voice·원조 효과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대표는 선진국·한국 공적개발원조(ODA)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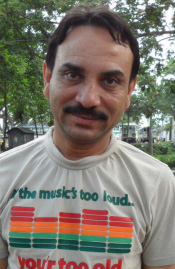
시민단체 ‘Voice’ 대표 무하마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 원조 제도를 운영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우리가 원조로 받는 돈의 75%가 다른 형태로 공여국으로 다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백개의 원조 프로젝트가 개도국에 쏟아져도 선진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이면서 자생력을 키워주기보다 오히려 망치고 있다.
→원조가 결국 ‘주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
-원조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원조 자금으로 대규모 댐을 건설하면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야 한다. 생활이 파괴되고 인권을 침해받아도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는다. 미국이 전체 원조액의 50%를 이스라엘에 주는 것도 선진국의 원조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안은 무엇인가.
-받는 나라 국민들을 국가 발전 전략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원조를 명목으로 수원국의 정책을 바꾸는 조건을 강요하는 등 주권을 해쳐선 안 된다.
→한국의 원조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원조를 줄 때 자국 용역과 물품을 고집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가 문제다. 한국의 원조기관과 사용·관리·유지하는 지역사회 간 소통도 없었다. 유상원조는 공여국인 한국 국민이나 수원국인 방글라데시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쪽 국민 모두 돈의 흐름과 효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가 된 한국의 원조는 개도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한국은 원조 역사에서 흥미로운 사례다. 받는 원조, 주는 원조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받는 나라 사람들이 느낄 고통과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안다. 오는 11월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에 도출될 전략이 세계 원조 담론에 새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11-07-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김정은 “특별한 선물”…아빠 옆에서 저격소총 쏘는 김주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8/SSC_202602280948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