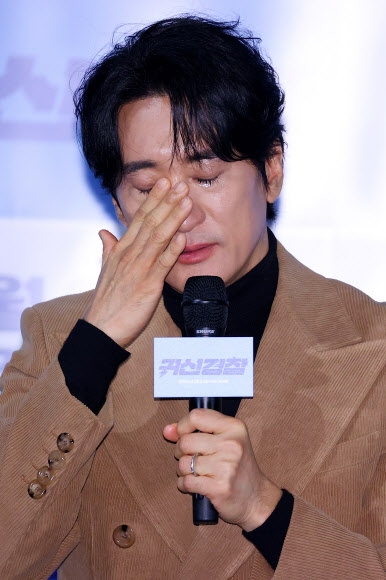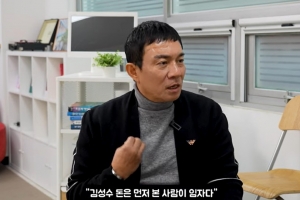영화는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자연 위성이 아니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달의 기원과 생명을 다룬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에머리히 감독은 “달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매료됐고, 만약 이 물체가 지구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전 궤도를 이탈한 달이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지구의 중력과 물리적인 법칙이 붕괴되면서 인류는 거대한 해일과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 엄청난 재난을 마주한다.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지만, 우주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 자칭 ‘박사’ KC(존 브래들리)는 “달은 위성이 아니라 거대 구조물이며, 달의 궤도가 전과 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KC의 말을 유일하게 믿어 주는 이가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브라이언(패트릭 윌슨)이다. 10년 전 우주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는 KC의 주장에 힘을 싣고, 결국 NASA도 3주 이내에 달이 지구와 충돌한다고 예측한다. 정부가 달 착륙에 대한 비밀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NASA 연구원 파울러(할리 베리)는 옛 동료 브라이언과 KC와 함께 박물관에 있던 유인왕복선 인데버호를 타고 달로 향한다.
감독은 우주와 지구의 사투를 번갈아 가며 재난영화의 전형을 보여 준다. 거대한 크기의 달이 부서져 지구로 쏟아지는 모습이나 달 내부의 고리형 구조물, 전 세계 랜드마크들이 파괴되는 장면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을 통해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상에서 펼쳐지는 카체이싱 추격전은 긴박감을 더한다.
하지만 감독은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의 공식을 그대로 답습해 흥미를 반감시킨다. 특히 가족과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가족 간 갈등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평면적으로 다가온다. 달에 대한 음모론을 소재로 했지만, 개연성이 부족하고 상상력과 스케일만으로 카타르시스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 ‘자기 복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후반부에 몰아치는 스펙터클은 인류 멸망이라는 주제 아래 자신만의 연출 스타일을 뚝심 있게 고집해 온 감독의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12세 관람가. 16일 개봉.
이은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