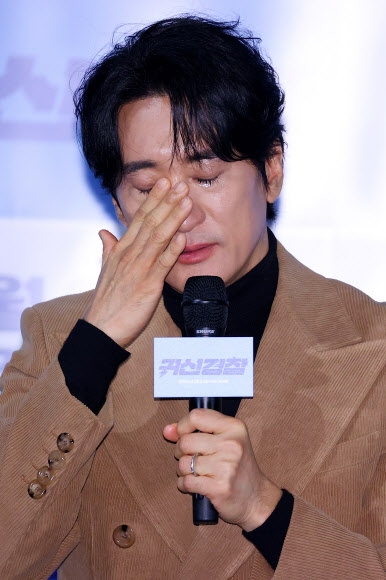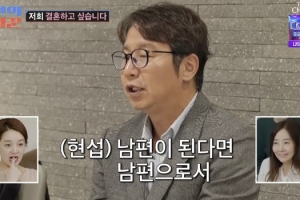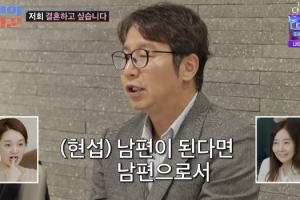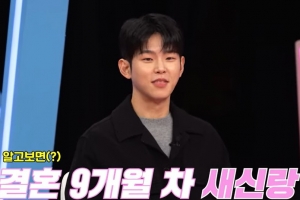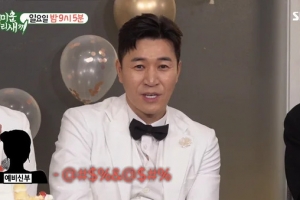동완은 자신의 밴드와 함께 무대에 오르겠다는 꿈을 안고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의 사무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무대에 설 기회는 오지 않고, 밴드 동료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간다. 동완의 직장 상사가 푸드코트에 부스를 마련해주자 동료들은 돈을 벌어서 음반을 내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지만, 동완은 영 마뜩지 않다. 한편, 보잘것없는 이력 때문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던 필립은 동완의 군대 인맥으로 록 페스티벌의 영어 통역 자리를 얻는다. 그는 부족한 영어 실력을 털털한 성격과 취업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 넣으며 고군분투하는데, 일본어 통역으로 들어온 미나와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미나에게는 유명 뮤지션이 된 후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를 만나겠다는 꿍꿍이가 있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 영화는 유명 뮤지션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렌지 렌지와 같은 유명 밴드도 동완이나 미나와 함께 잠깐씩 등장하는 조연일 뿐이다. 대신 영화는 화려하고 우렁찬 무대의 뒷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행사를 만들어가는 직원들이 주인공이다. 카메라는 세 주인공의 동선을 분주하게 쫓으며 록 페스티벌 스태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사건·사고들-게스트의 돌발 행동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크고 작은 실수, 진상 관객 출몰과 그에 대한 대처 방식 등을 속도감 있게 펼쳐놓는다. 여기에 동완이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 뮤지션들과 갖게 된 친분 및 교감이라든가 필립과 미나 사이에서 피어나는 묘한 감정 등이 또 다른 차원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공연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주인공들이 함께 즐기는 오렌지 렌지의 공연은 록 페스티벌 현장의 젊고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영화가 머금고 있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듯한 이 장면은 음악을 잘 모르는 관객들조차 리듬을 타게 할 만큼 역동적이다. ‘내가 고백을 하면’, ‘산타바바라’ 등을 만들었던 조성규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맛깔스런 대사들로 어색할 수 있는 영화적 순간마다 웃음을 유발시킨다. 심각한 갈등 상황이나 위기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캐릭터들은 어쩌면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인물들일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이 시대에 위로를 전달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제목이 천명하듯 이 영화는 ‘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꿈의 범위와 모양새는 너무나 다양해서 때로는 엇갈리고 부딪치기도 한다. 음악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하는 동완에게 꿈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이상에 가까우며, 일을 하고 싶은 필립에게 취업은 닿을 듯 말 듯 눈앞에 있는 현실적 목표다. 그러나 이것은 씁쓸하거나 우울한 ‘아이러니’-모순-와는 거리가 멀다. 영화의 결말은 오히려 우리가 저마다 다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여준다. 쌀쌀한 겨울날, 록 페스티벌의 열기가 그리운 이들에게 추천한다. 26일 개봉. 12세 관람가.
윤성은 영화평론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