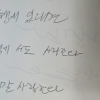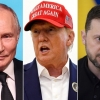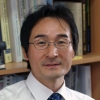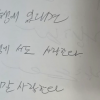중국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플라스틱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에 대비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요가 줄자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공장이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쌓이는 재고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중국은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의 순수입국이었다가 올해 3월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브라질로도 수출돼 한국·일본 등 전통 석유화학 강국들이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철강·태양광 패널 사태처럼 또 다른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미칼 메이단 책임자는 “서구 업계가 중국 플라스틱 과잉 생산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생산량 감축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플라스틱 덤핑 가능성을 예의주시한다. 특히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플라스틱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