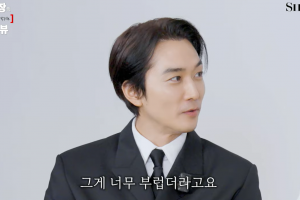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사고가 있었던 2018년 마지막 날, 오전에 모교 학생들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자살예방교육시간을 만들었다며 함께하자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마지막 연락이 됐다.
그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저 그 병 알아요”라고 환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냈다.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정신과 의사를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 원고를 보고 환자들이 편견을 갖지나 않을까 걱정한 내게 그는 본인이 감수할 일이라고 했다.
2019년 1월 2일 아침 유족의 전화를 받았다.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고인의 뜻이라 전했다. 영결식장에서 부인은 유지를 이어 달라며 조의금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 바르게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동료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듣고 평소답게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걸 알게 됐다.
사실 임 교수 사고나 작년 진주 방화사건 같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방치된 아픈 사람에 의해 발생해 왔다.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 문제는 본인과 가족이 감당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국민소득은 높여 왔지만,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2020년 한국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살로 잃은 생명이 작년 1만 3799명이었다. 코로나19로 국민 정신건강의 여러 지표가 악화돼 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검사하고 집을 찾아가 챙기고 치료로 연계하는 나라지만 아직 정신건강과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분절돼 있다. 반면 미국의 자살예방핫라인은 구조를 요청하면 집에 찾아가서 지원과 치료를 연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없이는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고인은 별명이 ‘독일병정’일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지만 환자에겐 참 따뜻한 의사였다. 손 오그라들게 나서는 일은 잘 못했다.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이루고자 한 꿈에 대한 관심을 바랄 것이다.
그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를 통해 그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를 꿈꾸었다. 코로나19가 매서운 시기 주변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끝으로 말하기를 통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함으로써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2020-10-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