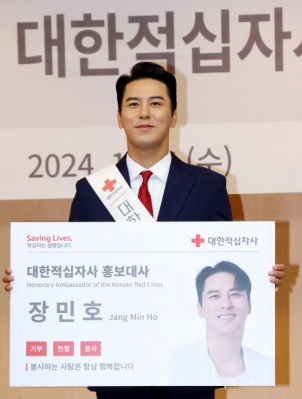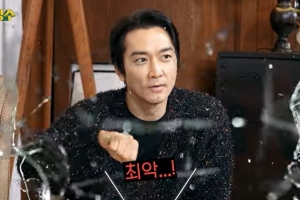‘사냥의 시간’은 금융위기로 희망이 사라진 도시, 감옥에서 출소한 준석(이제훈 분)이 친구 장호(안재홍 분)와 기훈(최우식 분), 상수(박정민 분)와 함께 도박장을 터는 얘기다. 그 돈을 들고 대만으로 튀겠다는 기대도 잠시, 곧 정체불명의 추격자 한(박해수 분)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목적이 단순히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것 이상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이들을 풀어 줬다가 다시 뒤쫓는 객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사냥의 시간’이다.
윤 감독은 자신이 쌓아올린 배경에 대해 “미래라는 개념에 집중하지 않은, 우화적인 공간”이라고 거듭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기억 속 IMF 사태나 남미 여행이 힌트가 됐다. “남미 화폐가 굉장히 무가치하거든요. 음료수 하나 사려고 해도 화폐를 돈다발로 가져가야 해요. 그런 기억들을 참고 삼아 세계관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박장을 터는 그네들의 ‘한탕’ 이후 영화는 공포물인가 싶을 정도로 서스펜스가 두드러진다. “범죄물과 서스펜스, 서부극 엔딩의 장르적 차용까지 여러 장르를 동시에 다루고 싶었다”던 윤 감독의 의지가 빚어낸 일이다. 긴박한 서스펜스를 돕는 건 주연들의 호연이다. 영화는 애초에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이라는 충무로 최고의 청춘 스타들을 캐스팅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월 말 개봉 예정이던 영화는 해외 판매 대행사와의 송사 등 여러 부침 끝에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영화는 짙은 색채의 이미지, 힙합 프로듀서 프라이머리가 음악감독을 맡은 강렬한 사운드 덕에 극장 상영이 더 적합해 보인다. 친구의 자살을 둘러싼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인 ‘파수꾼’과는 다른 결이다. 윤 감독은 “직선적인 이야기 안에서 사운드와 이미지의 힘으로 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 공개를 위해 사운드 믹싱을 다시 했다는 그는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시청자들에게 부탁이 있다면 “핸드폰이 아닌 조금이라도 큰 화면으로, 소리를 크게 해서 보는 것”이다.
그가 ‘파수꾼’과 ‘사냥의 시간’ 사이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다. “200억원 규모의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가 잘 안 됐어요. 독립영화 한 편 하고 200억원 상업 영화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격상 칼을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가는 편이라…. 여우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 영화감독 윤성현은 더욱 유연해졌다. “저는 이제는 감독이 글(시나리오)도 써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감독으로서 어떤 구성, 어떤 음악과 사운드 이펙트로 영화가 보이는지에 집중하고 싶고요. 다양한 작품으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는 게 감독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선배 거장들을 떠올리며 그가 새로이 내린 결론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