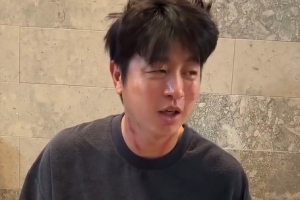하지만 한국영화는 2년 만에 침체기를 극복하고 200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낸다. 시장 규모에 맞는 한국형 장르가 다듬어졌고, 상업영화와 작가주의 영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감독들이 작품을 이어갔다. 이번 연재는 2000년대 중후반의 한국영화가 어떻게 도약해 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대 중후반 한국영화에서 주목할 장르 키워드는 바로 사극과 스릴러다. 퓨전의 길을 택한 사극·시대극 그리고 범죄·액션과 결합한 스릴러 장르는 다양한 장르적 요소와 이합집산하며 더욱더 진화해갔다. 이러한 장르 다변화와 ‘복합장르화’ 경향은 2010년대로 이어지며 ‘한국형 장르’가 구축되는 방법론이 됐다. 물론 한국영화의 전통적인 장르인 멜로·로맨스와 1990년대의 인기 장르였던 로맨틱 코미디도 관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1960년대 한국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사극 장르는 2000년대 들어 현대적인 감각의 퓨전 사극으로 부활했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이재용, 2003)를 시작으로 2005년 ‘혈의 누’(김대승)·‘형사 Duelist’(이명세)가 이어졌고, 2005년 12월에 개봉한 ‘왕의 남자’(이준익)는 1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사극 흥행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시나리오를 쓴 김대우 감독은 대담한 상상력과 세련된 유머가 돋보인 ‘음란서생’(2006)과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방자전’(2010)을 내놓으며 퓨전 사극의 유행을 이끌었다. 2000년대 후반에도 사극의 인기는 계속되었는데, 고려 왕조를 배경으로 에로티시즘과 결합한 ‘쌍화점’(유하, 2008), 한국형 히어로물을 표방하며 판타지 장르에 도전한 ‘전우치’(최동훈, 2009)가 대표적이다.
근현대사의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시대극 장르도 주목할 경향이다. 2004년에는 ‘효자동 이발사’(임찬상)·‘하류인생’(임권택) 등 근현대사를 가공하거나 ‘슈퍼스타 감사용’(김종현)·‘역도산’(송해성)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노스탤지어 영화들이 수확됐다. 2005년에는 대통령 시해 사건을 블랙코미디 감각으로 풍자한 ‘그때 그 사람들’(임상수), 일제강점기 여류 비행사 박경원의 일대기를 그린 ‘청연’(윤종찬)이 이어졌다. 2007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화려한 휴가’(김지훈)가 전국 730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

액션과 스릴러는 장르 특성상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장르인 액션이 더 전면으로 나서는 영화들도 있었다. 2010년에는 남북 분단 상황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의형제’(장훈)가 540만 관객을, 2011년에는 ‘감성 액션’을 표방한 ‘아저씨’(이정범)가 61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과 비평 모두 주목을 받았다.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로맨틱 코미디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 법칙을 새롭게 재해석한 ‘달콤한 거짓말’(정정화, 2008), 박중훈의 귀환과 ‘88만원 세대’의 묘사가 인상적인 ‘내 깡패 같은 애인’(김광식, 2010), 장르 화법에 더없이 충실했던 ‘시라노: 연애조작단’(김현석, 2010), 기획 코미디의 힘을 보여준 ‘댄싱퀸’(이석훈, 2011), 46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성공작 ‘내 아내의 모든 것’(민규동, 2012), 키치적인 B급 정서가 매력적인 ‘남자사용설명서’(이원석, 2012) 등이 이어졌다. 멜로를 코믹호러에 접붙인 ‘달콤, 살벌한 연인’(손제곤, 2006), 로맨틱 코미디의 뼈대에 호러를 녹여낸 ‘오싹한 연애’(황인호, 2011)도 주목받았다.
●예술영화·상업영화 아우르는 작가주의
1996~1997년 데뷔해, 2000년대 초중반 주요 해외영화제를 통해 인정받은 작가주의 감독 홍상수, 김기덕, 이창동은 미학적 성숙을 거듭하며 그들의 영화세계를 완성시켜갔다.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치면 단연 홍상수다. 그는 매년 1~2편의 작품을 연출하며, 새로운 미학적 실험과 변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04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2005년 ‘극장전’, 2006년 ‘해변의 여인’, 2008년 ‘밤과 낮’·‘첩첩산중’(단편), 2009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10년 ‘하하하’·‘옥희의 영화’, 2011년 ‘북촌방향’ 등 언뜻 앞의 영화와 겹치는 듯하면서도 매번 기존의 틀을 바꿔가는 방식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 마치 거울처럼 마주 보는 그의 연작들은, 각 영화의 제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차라리 ‘홍상수 영화’로 호명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평적 해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국내외 비평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예술영화 관객들의 지지도 굳건하다.
김기덕은 ‘활’(2005), ‘숨’(2007), ‘비몽’(2008) 등 본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는 영화다’(장훈, 2008)·‘풍산개’(전재홍, 2011) 등 조감독 출신 감독의 영화 제작까지 겸했다. 그는 ‘아리랑’(2011)으로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피에타’(2012)로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안았다. 이창동 역시 인간의 실존적 고통과 구원에 관한 질문을 멈추지 않으며, 미학적 성취를 이어갔다. ‘밀양’(2007)은 제60회 칸국제영화제 장편경쟁부문에 진출, 주연 배우 전도연이 한국영화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시’(2010)는 제63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각본상을 받았다. 한편 이창동은 2009년 제62회 칸영화제에서 장편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2011년 제64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 외에도 ‘천년학’(2007)으로 100번째 영화를 연출한 거장 임권택,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을 로맨스 장르에 녹인 ‘멋진 하루’(2008)의 이윤기, 리얼리즘과 신비함이 뒤섞인 ‘파주’(2009)의 박찬옥, 제주도 4·3 사건을 독특한 미학으로 승화시킨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2’(2012)의 오멸 등이 작가주의 영화의 계보를 이었다. 또한 제28회 밴쿠버 영화제에서 용호상을 수상한 ‘회오리바람’(2009)의 장건재,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을 예리하게 포착한 ‘무산일기’(2010)의 박정범,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창조한 ‘파수꾼’(2010)의 윤성현 등 인상적인 독립장편영화로 데뷔한 감독들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박찬욱은 ‘복수 3부작’의 완결편 ‘친절한 금자씨’(2005), 디지털 영화 미학을 개척한 ‘싸이보그지만 괜찮아’(2006), 제62회 칸국제영화제 장편경쟁부문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박쥐’(2008), 그리고 첫 번째 할리우드 영화 ‘스토커’(2013)까지, 영화적 야심과 예술가적 자의식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 김지운은 만주웨스턴 ‘쇠사슬을 끊어라’(이만희, 1971)를 오마주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고어 영화(선혈이 낭자하는 잔인한 묘사가 특징)에 가까운 하드보일드 ‘악마를 보았다’(2010) 등을 통해 특유의 장르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