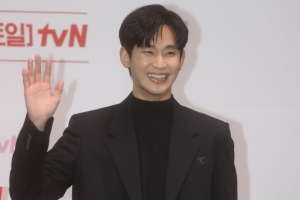배우 유해진(48)에 대한 관객들의 믿음은 견고하다. 어떤 전형적인 장면도 현실에 살을 착 맞댄 섬세한 표현으로 맛깔나게 살려내기 때문이다. ‘럭키’(700만), ‘공조’(781만), ‘택시운전사’(1218만), ‘1987’(723만) 등 2년 새 출연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한 데는 ‘믿고 보는 배우’ 유해진의 노력도 깔려 있다. 9일 개봉하는 ‘레슬러’는 그의 매력에 한껏 기대 굴러가는 영화다.

‘레슬러’에서도 그의 남다른 분투가 장면 장면마다 엿보인다. 전직 레슬링 국가대표였으나 이제 정육점에서 고깃값 흥정하기에 바쁘고 색 고운 국산 고춧가루에 열광하는 ‘프로 살림꾼’이 된 귀보(유해진). 동네 체육관을 운영하며 레슬링 선수인 아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그는 레슬링을 그만두겠다는 아들 성웅(김민재)의 난데없는 반항과 아들 친구 가영(이성경)의 엉뚱한 고백으로 혼란에 빠진다.
영화에서 그는 평소 쌓아 둔 살림 내공을 발휘하며 재치 있는 애드리브로 관객을 웃긴다. 체육관에서 주부들에게 에어로빅을 가르치다 사무실로 슬쩍 도망쳐 구토라도 할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장면에선 유해진 특유의 친근하고 능청스러운 매력이 잘 드러난다. 영화 ‘블랙잭’(1997)에서 악역으로 연기에 발을 들인 지 21년째인데도 그는 밤잠을 설치며 연기 아이디어를 짜내는 데 골몰한다고 했다.
“촬영 전날 유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왜 이렇게 안 풀리지’하며 잠 못 자고 고민해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걸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쾌감도 있고, 촬영 현장에서도 서로 좋다고 ‘으으’ 할 수 있어야 분위기도 좋아지거든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레슬러’는 부모와 자식의 성장, 배우로서의 성장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영화는 아들의 성장뿐 아니라 부모의 성장이기도 해요. 서로 갈등을 겪은 뒤 여물어가는 과정이 짠하고 감동적인 작품이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요. 아버지께서 오십대 때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신 밤에 ‘어머니’하고 목놓아 우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삶에서 힘든 것이 갑자기 확 오셨던 것 같은데 요즘 그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번 영화는 어느새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된 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기도 했죠.”
배우로서 그의 진통과 성장은 언제였을까. 그는 30대 초반을 기억에서 꺼냈다.
“생활도 힘들고 배우로서 활동도 쉽지 않았던 30대 초반 연기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얘기가 배우 인생에 큰 힘이 됐어요. 맡고 싶은 배역이 안 오고 그래서 속상했을 땐데 그러셨죠. ‘해진아 넌 평생 연기할 것 같은데, 한 작품 가지고 왜 그래. 내가 70년 넘게 살아 보니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걸 했나 안 했나더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때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에게 숫자는 순간의 기쁨일 뿐이라고 했다. “요즘은 너무 (영화에 대해) 숫자로 이야기하는 시대라…. 흥행은 기쁘긴 하지만 몇만의 의미보단 함께했던 사람들이 웃음 지을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기분 좋은 건 현장에 있을 때죠. 서로 손발이 잘 맞고 느끼는 걸 함께 이야기할 때가 참 행복하지 않나, 그게 연기하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